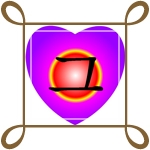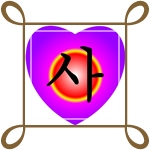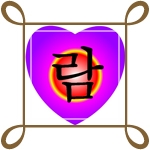어쩐지 느낌 안 좋으면 더 조심했어야 했지.
훤한 대낮인데도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까 그랬는지 자꾸만 졸립니다.
저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됐든지 마땅한 일거리를 만들고 싶었지요.
그랬더니 문득 부엌칼이 떠오르데요.
보름은 지났겠고 대략 한 달쯤 됐으려나? 맞아요! 그때 느닷없이 설 준비하느라고 그랬으니까 한 달은 조금 더 지났을 성싶네요.
그때도 스사 삭 잽싸게 칼질하지 못하고 어쩐지 느릿한 어머니 모습 보면서 대뜸 칼날이 무뎌서 그럴 거로 확신하여 부랴부랴 칼을 갈아드렸답니다.
아파트에서 칼을 갈려니까 참 곤란하데요. 그날은 급하기도 했고 또 마땅한 장소도 없기에 나중엔 거실에 나와서 갈았지만, 처음엔 화장실에 들어와서 갈았었는데 아무래도 아래층에서는 무척 불편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화장실에서 스르륵 스르륵 칼 가는 소리 들려왔다면 이 얼마나 불쾌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에 나가긴 했어도 단 한 순간이라도 느꼈을 그 심기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그 전 한가할 때 그랬던 거처럼 마을 저 건너에 자리한 개천(영산강 줄기)으로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요번에도 예전과 별다를 것도 없이 여전히 물은 흘렀고 군데군데 낚시하는 사람·산책하는 사람 여러 질이 있습니다.
전에는 다이아몬드 숫돌도 없이 금강석 숫돌만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깔고 앉을만한 의자도 없었기에 모래톱에 시장바구니 깔고서 펑퍼짐하게 앉아서 금강석 숫돌에 갈았었는데 이번엔 채비가 충분합니다.
하여 맘먹고 바윗돌 많은 곳에 내려서긴 했지만, 오히려 그 자리가 더 불편하단 걸 알았을 땐 이미 늦어버렸지요.
- 부엌칼 네 자루, 금강석 숫돌, 다이아몬드 숫돌, 나무로 만든 숫돌 받침, 앉은뱅이 의자, 그 모든 것 챙겨간 멜빵 가방 -
~ 나쁜 하늘 - 01 ~
아무리 애써봐도 거기 돌 틈바구니에서 나무로 만든 숫돌 받침이 들어설 자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받침을 뉘어도 보고 돌려도 보고 별짓을 해도 안 나오니까 차라리 나중에 집에서 그랬던 거처럼 칼이 아니라 숫돌을 밀어서 칼을 갈아야 할 처지까지 간듯했지요.
그래도 어디 거기까지 나가서 그럴 수가 있나요? 사나이 체면이란 것도 있는데…
겨우 어렵사리 자리를 잡고는 금강석 숫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숫돌을 먼저 대고서 갈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다이아몬드 숫돌이 너무 거치니까 그걸로 대충 간 뒤에 금강석 숫돌로 마무리하려고 가져간 거가 맞긴 하니까 그 순서가 틀린 것도 아니었지…
문제는 그다음에 생겨버렸죠. 오랜 시간 간 것도 아니고 2~3분 남짓의 짧은 시간 갈고서 얼마나 갈렸을지 가늠해 보려고 엄지손가락 바닥으로 쓱 한번 문지르는 순간입니다.
'쓱!' 섬뜩합니다. 수십 년간 갈아왔지만 제 삶에서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입니다.
40여 년 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칼을 갈고 낫을 갈며 살았습니다.
그 시절의 부엌칼은 요즘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그야말로 무쇠 칼이었거든요.
칼이며 낫 심지어는 도끼까지도 그 날이 무디면 장작불 지핀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서 커다란 몽돌 가운데 놓고서 검붉은 장작불 숯이 나오면 그걸 화로 삼아서 칼이며 낫 도끼 하물며 호미까지도 넣고서 벌겋게 달궜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아오르면 펜치며 망치 손잡이에 물 묻힌 헝겊(걸레) 감싸고서 그걸 들고서 그놈들 단단히 틀어잡고서 마구 내려쳤지요.
그 언젠가 장날 대장간에서 봤던 걸 그대로 흉내 내면서 커왔습니다.
그렇게 손질한 연장으로 별것(새총, 화약총, 페달만 없지 바퀴 달리고 핸들 돌아가는 세발자전거)을 다 만들었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의 연필 어찌 그리도 자주 부러졌는지 모릅니다. 연필심이 아니라 연필이 말이에요.
70년대 초에 초등학교 다녔던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쁘게 잘 깎이고 글씨도 굵게 나왔던 4B연필 아시죠? 그런데 그건 비싼 거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몽당연필도 귀한 판국이라서 연필에 옹이라도 박힌 건지 어쩌다가 사온 오 원(오십 환)짜리 연필이 문구 칼(면도칼이라고도 불렀음)로 예쁘게 깎으려고 하면 그 끝이 톡 부러지곤 했잖습니까?
그랬던 시절 저는 연필을 부엌칼로도 또 낫으로도 깎아보곤 했었답니다.
그런데 연필이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깎이질 않았습니다. 들판의 푸성귀처럼 야산의 잡목처럼 댕강댕강 잘릴 줄 알았는데 칼·낫 제아무리 정성 들여서 갈고 난 뒤 깎아봐도 무딘 문구 칼만 못했답니다.
그랬던 제가 엄지손가락 들여다보니 세상에 숫돌 물이 배 시커먼 일자가 그어졌네요. 그리고 쓰렸습니다.
방금 갈 칼에서 손을 베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느낌이 안 좋습니다. 당장에라도 철수하고서 떠나오고도 싶었지만, 기왕에 가져간 칼은 모두 간 뒤에 오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 여겨지기도 해서…
다이아몬드 숫돌만으로도 그렇게 날카롭게 갈리는데 인제 굳이 금강석 숫돌은 일도 없어졌지요.
나머지 세 자루도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갈아냈으니까 인제는 챙겨서 돌아오면 끝이었지요.
그런 생각에 칼이며 숫돌 그리고 숫돌 받침까지 흐르는 물에 씻기면서 또 손가락 벤 자리 씻어내면서 뿌듯한 맘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모두를 가방에 담고서 챙겨오면 끝날 일이었는데 몸을 돌이키는데 그 울퉁불퉁한 돌 사이에서 몸이 제대로 가누질 못합니다.
'어! 어? 어^' 뒤틀리더니 기어코 '철퍼덕 풍덩!!!' 엉덩이까지 흥건합니다.
정말 미치겠데요. 집에서 나오기 직전 운동화 말고 예전처럼 슬리퍼를 생각 못 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몇 년 전 동생 놈이 큰돈 들여서 사줬던 운동화! 오늘 기어이 물 범벅 시키고 말았습니다.
~ 나쁜 하늘 - 02 ~
제가 지닌 장애 특기 중 하나가 몸 중심을 못 잡는 것인데 하필이면 이럴 때 그 특기 발휘할 건 또 뭐래요!!!
속상합니다. 이 절묘한 순간을 꼭 그렇게 연출했어야 하는 하늘이 지독히도 믿습니다.
~ 나쁜 하늘 - 03 ~
- 쏘리~ 착한 하늘 / 그러니까 순진한 너 말고 나쁜 하늘~ 그놈의 자식 말이야!!! -
'짙은 녹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어이구~ 드디어 장애인네트워크 회선도 장애를 입었나 보다! (0) | 2016.03.16 |
|---|---|
| 어허^ 그놈 시작 메뉴가 벌떡 일어났던 게 아니었구먼! (0) | 2016.03.15 |
| 413총선이 무슨 소린고 했더니… (0) | 2016.03.14 |
| 비즈프리 웹 호스팅 오늘이 만료일입니다. (1) | 2016.03.11 |
| 아따 간만에 더플에 달린 게시판으로 행차해봤습니다. (0) | 2016.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