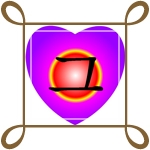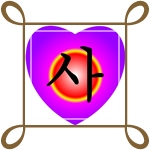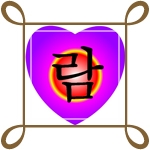밤길 거닐면서
어젯밤 저녁 참인데 저녁 끼니 뜨는 둥 마는 둥 했던 거 같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몸이 좀 찌뿌듯했었거든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몸 그럴 땐 집안에 틀어박힌 거보단 조금이라도 산책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걸 알기에 망설이지 않고 집을 나섰지요. 멀리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나 한 바퀴 돌고 오려고요.
아파트 후문을 나와 정문을 통해 들어오는 거리 길게 잡아본 들 200m도 안 될 아주 짧은 거리거든요.
처음엔 아주 간단한 맘에서 그렇게 출발했는데…
아파트 후문을 벗어나 차도와 인접한 아파트 옆길을 걷는 중입니다.
그 길은 그 옛날 우리 집 큰아들과 막내가 지났던 아파트 근처에 있는 자기들 학교(중학교, 초등학교) 통학로이기도 하지요.
그런 이유로 제가 지나는 앞뒤로는 어린 학생들 한둘이 혹은 몇몇이 짝지어 지나가는데…
거기엔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여학생들도 있어 무심코 나란히 혹은 앞뒤로 걷는 중인데 그 여학생들 재잘거림에 천상의 목소리가 새나옵니다.
정말이지 조심스럽게 걷거든요.
비틀거리는 몸이기에 사람들 앞뒤로 지나면 그들 무서워할까 봐 혹은 부딪힐까 봐 완전히 얼어서 걸었거든요.
제 신경 온통 걸음걸이에 집중한 중에도 그 예쁜 천상의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흠 뭐 뭐 ~였어요.'
긴 내용도 아니고 오로지 달랑 그 끝나가는 몇 마디가 스치면서 그들과 지나쳤지만, 제 가슴 먹먹해지데요.
'아아~ 저 예쁜 서울말이 도대체 얼마 만이냐…'
그 깊이도 모를 아득한 속으로 들어가느라고 그 짧은 거리 아파트 만 도는 걸 그만두고 더 멀리 돌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정문 쪽으로 향하지 않고 곧바로 차도를 건너 건너편 아파트 블록을 돌기로 했지요.
때로는 뒷짐을 지고 또 때로는 팔을 흔들며 앞으로 나아갔지요.
마음속에서의 '과거 뒤집기'와 현실에서의 '눈길에 안 미끄러지기' 이 둘을 짜깁기하려면 그만큼 몸놀림도 조심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여섯 시가 조금 넘어서 집 나왔는데 바깥은 꽤 어둡습니다.
추억의 밤길·낭만의 밤길 - 01
아파트 단지 몇 개를 지나 다음 블록을 꺽어들면 거기서부턴 정말이지 한적하거든요.
추억의 밤길·낭만의 밤길 - 02
대략 30년도 조금 더 되었네요.
그 해(79년도) 초겨울이었을 거예요.
동력 없이 노 저어서 나다니는 조그만 목선을 몰고 문밖 해안에서 100m 남짓한 거리에 있었거든요.
통발을 써서 바닷게를 잡아 가용으로도 쓰고 학비에 보태기도 하면서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날도 그 연안에서 그 통발 손보는 중인데 누군가가 부둣가에서 제 이름 마구 부르는 거였지요.
사립고등학교 시험을 봤었는데 합격했다는 통지를 우리 마을이 아닌 더 큰 마을의 전화가 있는 집으로 했었나 봐요.
우리 마을에도 전화가 있긴 있었는데 학교에서 그걸 추적해내질 못해 인근 마을의 약국으로 했었던지 큰 마을의 약국에서 한 아이가 달려온 것입니다.
거기 약국에서 우리 집까지는 2Km도 넘을 아주 먼 시골 길인데 녀석이 그것 전하려고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그 소식 듣자 뒤로 나자빠졌다고 그러더군요.
궁색한 살림에 중학교 가르치는 것도 겨우겨우 해냈는데 고등학교까지 보내기엔 너무나도 벅찼던 겁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사정이었었고요.
제 친구 더 엄밀히 말해서 중학교 다니면서 쪽지 받아서 연인이 됐던 제 여자친구 말입니다.
그것 중학교에서 학업을 접어야 했었답니다.
그리고는 서울로 떠났어요.
돈 벌러 간다고 서울로 떠났어요.
그 당시 중학에서 마친 많은 친구가 돈 번다고 서울로 떠났던 거처럼 녀석도 서울로 떠났지요.
제가 광주에서 유학생활(?)에 치중하느라고 자주 연락할 기회는 없었지만, 그래도 간간이 또 꾸준히 주고받았던 친구도 그 녀석입니다.
고3쯤 됐을 무렵엔 경기도 어디서 재봉틀 돌린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하더라고요.
(꽃 편지 주소엔 이렇게 →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지금 3리…)
그 시절(82년도) 저는 백 원짜리 동전을 모아 제 사는 곳에서 멀리까지 달려가곤 했었답니다.
광주 제 사는 곳(신안동 무등경기장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공중전화 부스(DDD 직통전화)가 임동 우체국 앞 도로변에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동전 넣고 녀석과 연결되면 저 꺼벅 죽었습니다.
'중근이니… 그래 그랬니…'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녀석의 서울말…
그 당시 들었던 서울말은 꽃 편지 열 장 백 장에서도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완전 새로운 기분이고 새 세상입니다.
그런저런 추억을 먹으면서 단지 뒤편 길 지나는 것 참으로 힘겹습니다.
추억의 밤길·낭만의 밤길 - 03
바깥 환경 그렇더라도 옛날 애인 떠올리니 기분은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추억의 밤길·낭만의 밤길 - 04
문제는 그 외진 길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정확히는 못 봤지만, 대략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인이 홀로 저 앞에서 오는 겁니다.
평지에서도 제가 비틀거리는데 그 눈길에서의 제 모양새 얼마나 거북스러웠겠어요.
더군다나 면장갑까지 끼고 있었으니까…
저는 그 여인 편하게 지나치게끔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무작정 가다가는 미끄러질 것도 같고…
서로 엇갈리는 지점에서 여인을 보니 휴대폰을 들고 계속하여 중얼거립니다.
그것이 실제 통화인지 위장 통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건 그 길바닥에서 미끄러지는 거였답니다.
제가 만약에 미끄러졌다면 그 어두운 환경에서 그 여인 까무러치거나 마구 뛰어 달렸을지도 모르지요.
추억의 밤길·낭만의 밤길 - 05
그 뒤로도 두 번 정도 홀로 지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다행히도 여인이 아닌 남자들이었었지요.
생각할수록 그 여인한테 미안하네요.
'나 때문에 놀랐을 아가씨! 정말이지 죄송하네요~'
앞으론 될 수 있으면 낮에 돌아다닐 것이며 밤에 나다닌다 해도 아예 초저녁이 아닌 깊은 오밤중에 나다닐 생각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와 마주칠 일도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어쨌든 추억 속에 잠긴 나만의 그녀!
이 밤도 좋은 꿈 꾸세요~
'짙은 녹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뭘 보는 거야 지금! (0) | 2015.01.07 |
|---|---|
| 무책임한 답변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맥이 풀릴까요? (0) | 2015.01.05 |
| 그 영화 나도 조금 봤다. (0) | 2015.01.05 |
| 해맞이는 정작 이번에도 못했구나~ (0) | 2015.01.04 |
|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 (0) | 201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