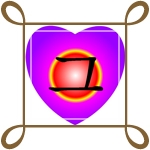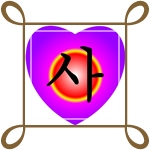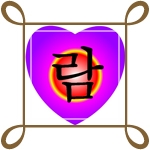순위 밖으로 밀려난 거가 어찌 그리도 황홀했던지 그 순간엔 몰랐습니다.
아침에 어떤 글을 썼는데 블로그(게시판)마다 다 옮기고서 오늘따라 무슨 일로 그걸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문장 중 어느 글자 딱 하나가 받침이 안 들어갔대요.
그 글자에 받침이 빠지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글이 돼버릴 뻔했지요.
천성이 게을러서 그런지 한번 올리고 나면 그렇게 되돌아보는 날이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 제 글 대부분이 어쩌면 오늘 고치기 전까지의 모습처럼 엉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도 그걸 못 봤으면 모를까 이미 봐버렸으니 고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쭉 고쳐가며 확인하던 중 저의 어떤 블로그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놀랐다기보다는 너무 좋아서 '하^~'터져 나오는 기쁨이 감춰지지 않았다고나.
제게 이리도 좋은 날이 올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 했으니까.
다름이 아닌 저와 같은 장애우들이 주로 쓰는 사이트인 '에이블'에 달린 블로그에서였습니다.
그곳에 블로그를 개설한 지가 정확히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블로그 개설하고서 얼마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블로그 순위는 늘 상위권에 있는 겁니다.
블로그 한쪽에 나온 '개인 블로그 주간 TOP3'라는 탭이 있는데 늘 그 자리에 올랐으니까?
심지어는 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며칠을 비웠다가 왔는데도 거기 TOP3에 들어갔지 뭐예요.
이는 우리 장애우들의 신체적 정신적 삶이 얼마나 고달프면 그것 쓸만한 여력도 안 된다는 이야기잖습니까?
서글펐습니다. 그냥 입바른 소리로 서글픈 게 아니고 참으로 아팠습니다.
그랬어도 절대로 꿈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자! 언젠가는 틀림없이 나를 제치고 이곳에 들어서는 자가 나올 거야!!!'
오늘 아침에 바로 그 꿈이 그야말로 꿈처럼 이뤄졌어요.
아직은 불안하지만, 틀림없이 이런 현상 지속하거나 더 늘어날 겁니다.
꼭 그랬으면 합니다.
~ 몽당연필의 추억 ~

오늘 저를 밀어버리고 올라온 사이트의 별칭이 '몽당연필'이네요.
저 이름을 보면서 잠시 아주 아련한 추억으로 들어가 봤어요.
저에게 맨 처음 학부인 초등학교가 1970년대의 시작과 함께였습니다.
그 어린 걸음으로 한 시간 가까이 산길과 신작로를 타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기와가 얹힌 기나긴 학교에 나무 좁다란 널빤지를 연달아 붙인 교실이며 복도 아마도 이런 식의 건축물을 일본식 건물이라고도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일정 때의 건물은 아니고 해방 후에 지어졌을 겁니다.
어쨌든 그 학교에서 6년을 보냈습니다.
그곳 널빤지로 된 교실 바닥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구멍들 아마도 오래된 널빤지에서 옹이가 빠져 구멍이 생겼을 거로 여겨지지만, 당시엔 몰랐지요.
무척 억척스럽고 난잡했던 제가 그 구멍을 그대로 뒀을 리가 없지요.
그곳 구멍 밑으로 시커먼 청엔 별의별 것이 있었으니까…
마치 '통 아저씨'가 그러는 거처럼 온몸을 완전히 조여서 환기구를 통해 그것에 들어갔는데 그 속은 그야말로 어둠 천지였지만, 옛날식 극장이 그랬던 거처럼 들어가서 시간이 약간만 지나도 서서히 밝아져 조금씩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구멍 뚫린 그 자리가 빛이 새서 담이 잡히니까 또 기어서 찾아들었죠.
그러면 눈코입귀 어느 곳 하나 멀쩡하게 놔두지를 않고 온통 시커먼 먼지가 쏟아지고 스며들었죠.
그런데도 연필 한 자루 살 만큼의 여유도 없었던 시골 살림 / 어떡하든지 캐내야 했습니다.
거기는 어려운 우리 집 형편 감싸줄 터전의 생계 맥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까 말했던 '몽당연필'도 나오고 또 어떤 날은 다 쪼개진 지우개나 면도칼이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날은 동전도 나왔습니다.
당시엔 '1원 5원 10원짜리 동전'이 대세였지만, 이따금 '50환짜리 동전'도 나오곤 했지요.
이것저것을 다 팔았는데 그 시절 말로는 '점방(요즘 말로 바꾸면 구멍가게 플러스 문방구쯤 되려나?)'에 가져가면 그걸 '5원'으로 쳐줬지요.
당시엔 연필도 잘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연필을 몽당연필이라고 불렀는데 그것 사인펜 대에 끼워서 쓰면 딱 좋았지만, 그 시절에 사인펜 그리 흔한 물건인가요?
가끔 저는 신우대(조릿대)를 깎아서 사인펜 흉내를 내어 박아보곤 했는데 필기구로써 영 자세가 안 나왔지요.
아~ 몽당연필~
침 묻혀 가면서 그걸로 '가갸거겨'도 쓰고 '구구단'도 쓰고 그보다 먼저 '방학숙제로 내주는 일기'도 '숙제 내는 날 한방에 거짓말로 줄줄이 몇 날 며칠 것을' 썼지요.
그 몽당연필이 그립습니다.
시집 장가는 잘 갔으며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도 알고 싶네요.
어쩌면 그놈 지금도 버릇 남 못 주고 침 묻혀서 또박또박 휘갈기고 있을지도요~
'짙은 녹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 잃어버렸던 점프 목록을 다시 찾긴 찾았는데… (0) | 2017.01.24 |
|---|---|
| 아~ '점프 목록' 도대체 뭣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는 거야!!! (1) | 2017.01.22 |
| 허허 참~ 랜섬웨어 툴이 어딨는고 했더니… (0) | 2017.01.21 |
| 이 둘을 동시에 업데이트하긴 좀 무리라고 여겼는데… (0) | 2017.01.18 |
| 업데이트 하나 잘빠지면 뭐하나 부팅속도만 해도 빵점인걸… (0) | 2017.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