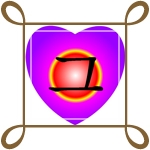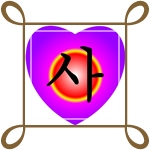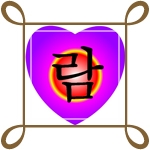목숨! 도대체 그것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지난 사흘을 고향 땅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제 어느 분의 삶이 마감했다는 전갈을 받았던 탓입니다.
상당 시간을 암과의 투병으로 무척 힘들어했었는데 가장 최근에 받았던 소식으로는 이젠 제법 그 뭔가를 드실 만한 수준까지 회복하셨다는 전갈을 받아 저로선 그분 가실 날이 머잖았음을 감지했던 짧은 나날에 종지부를 찍었던 소식이 그 소식이기도 했지.
그러잖아도 요즘 손목에 금이 가서 거동이 몹시 불편한 어머님이나 또 다른 형제를 다그쳐 기어이 못 따르게 하고는 결국 함께 지내는 동생과 함께 단둘만이 내려갔어.
거기 시골에 자리한 몇몇 대형 병원들 누군가의 장례식에 조문하려고 이전에도 몇 번 다녀간 적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요번처럼 적나라하게 그 생생한 현장을 봤던 적이 없었지.
왜냐면 그분이 친척이나 벗이었음에도 그 장례식 중심에 가까울 정도의 친분이 아니었기에 한걸음 물러서서 지켰던 거야.
했는데 요번엔 그 최고 단위와 중간 단위의 가운데쯤에 자리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할 단위가 너무도 적었기에 예전에 겪었던 그 어느 장례식들에서와 차원을 달리해 적극적으로 덤볐던 까닭도 한몫했을 테고…
무척 놀랐습니다.
장례식장 관계자로부터 염(가신 분 몸가짐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려는 가장 단정하고 바른 몸가짐으로 치장하여 몸을 묶어 관 속으로 입관하는 의식)을 해야겠다는 신호가 들어와 부지런히 가신 그분 모셨을 냉동실로 내려갔지.
왜 놀랐겠어? 글쎄 이미 벌써 가신 분의 차림이 모두 끝났단 거야. 옷가지 갈아입히고 닦을 곳 닦기도 하며 심지어는 구멍이라고 생긴 구멍은 모두 꽉꽉 틀어막기도 했고 얼굴이며 입술에 화장도 하던데 그 모든 것이 이미 끝난 채 깔끔하고 반듯한 자세로 누었지 뭐니.
그냥 이리저리 덮고서 묶은 뒤 내려간 우리 몇몇이 들고서 관에 내리면 그만이었지.
그냥 그대로 보내기엔 뭔가를 더 해야겠더라. 하여 이리저리 만져도 보고 들어도 보고 또 담기 직전엔 그중 유일하게 또렷하게 마치 기도라도 해봤던 사람처럼 그러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한 자세로 몇 마디를 건네주었지.
그걸 마치니까 약속이라도 했던 듯 관뚜껑을 닫아버리더군.
거기까지가 염하는 자리에서 꿈쩍였던 거 다였는데 그 자리서 나의 그분 너무도 안쓰럽더라.
재작년이었던가 3년쯤 전 언제쯤 되는 시점에서 그분 마지막으로 거기 시골에서 만났을 적만 해도 그분 육중한 몸으로 날렵하진 않았지만, 시골 사람이면 누구나 가진 품새로 움직거리는 걸 봤으며 또한 너무나도 살갑게 주고받았었는데 어쩌다가 그리됐을까?
마른 명태처럼 바짝 마른 자태며 솜털처럼 가벼웠던 그 무게는 또 어땠었고… 아~ 이리 살다가 그만 가고 말 거를…
가진 것이 너무나도 빈약하더라.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것 이미 약속했거나 진행 중인 거가 있었다 해도 그 전부를 다시 검토해야 했지.
마냥 그대로 진행했다간 그 뒤로 터질 후사 너무나도 혹독해질 게 불을 보듯이 뻔했지.
하여 그 짧은 시간을 여태 진행한 단위와 격렬한 소통(충돌·교환·협상)의 틀을 짜야 했다.
그 짧은 시간에 수백 년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긴 시간을 그것이 정통 장례절차였던 거로 여겼을 것을 뒤집어야 했네.
온갖 문중이라는 작은 틀·그렇게 해야 옳다는 고정관념이 나와 또 다른 나에게 퍼붓던 그 고성과 삿대질…
왜 그랬을까? 나 역시 그 높은 단위에 맞받아쳤지만, 쩡쩡 울리며 콕콕 쑤셔대는 그거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
그 속 모르는 외부에는 그 자리가 질책과 비난 그리고 청렴결백한 선비(저쪽 어르신들)와 배은망덕한 망나니(나와 또 다른 나)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난 전혀 그렇게 받아지지 않더군.
모두가 외피 벗고 나면 반드시 한길에 설 거라고 믿었으니까 가능했을지도 몰라.
그랬으니까 화장해야 하는 그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어쩌면 극적으로 우리 합의한 거야.
내 생애 이만큼 아름다운 합의는 없었던 거 같더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반듯한 유골함 하나도 마련해 내지 못한 우리 그래서 가장 싼 나무상자에 담아냈지.
그 처음이 따뜻하다 못해 따끈따끈하더라.
사각형의 나무상자의 따끔거림은 참아보겠는데 그것 각진 부분이 무릎과 손바닥 콕콕 찌르니까 차에 싣고 가는 내내 솔직히 조금 불편하기도 했지.
내 그런 사정 알기나 했는지 옆자리에 탄 어떤 어르신은 그 속도 모르고 혹시 차에 열선을 켰느냐고 묻기도 했지.
'크크 아직 술기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나 보네…'
그 마지막을 모두가 함께 치르면서 나와 또 다른 나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지.
하늘도 아셨는지 추적추적 비를 내리는가 하면 때로는 휘몰아치는 돌쇠 바람을 몰고 와서 그 직전에 구한 새 비옷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끔 제 맘대로 휘갈기기도 하대.
'목숨이란 게 이리도 허망하냐! 하늘도 무심하지 할까 봐 뭐 뀐 놈이 성낸다고 저가 먼저 성냈을 수도 있게 뻔해. 요놈아!!!'
부조금 들어온 거 탈탈 터니까 그것이 장례 비용과 아슬아슬하게 맞아떨어지더라.
더 정확히 말하면 기존 방식으로 하면 써먹었을 어떤 장치 그것 이미 제작해 버렸기에 그 비용은 지급해야 했어!
그러면 어떡하나? 오륙 십만 원이 부족할 텐데…
그 모든 걸 총괄 지휘하느라고 애쓰신 시골의 우리 큰형님! 자기가 알아서 계산해볼 테니까 신경 쓸 것 없다며 애써 웃음 지어 우릴 보내 주셨지.
그 웃음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 또 얼마나 허탈한 것인지. 이번 사태에 가장 거칠게 배신했던 저 류중근 뚜렷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형님 또 다른 형님 그리고 작은아버지 또 또 다른 작은아버지뿐만 아니라 작은어머니와 형수님 그 곁으로 여러 오촌 어르신네들 그 밖에도 그 심기가 터질 듯이 불편했을 그 모든 우리의 울타리 여러분…
중근이 사죄합니다. 백번을 쳐 죽여도 속 풀리지 않았을 그 찢어지는·미어터지는 분노…
왜 몰랐겠습니까? 하여 너무나도 죄송했고요, 또 몸으로 말로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을 만치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요람에서 무덤에 이를 때까지 차별받지 않는 세상 꿈꾸게끔 제 목숨이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 돼지꿈이 되고 또 용꿈이 되고자 다짐해 봅니다.
오 나의 지난 사흘은 색즉시공(色卽是空)이었음이라~
'짙은 녹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잃어버린 내 인스타그램의 정보 겨우 찾아오긴 했는데… (0) | 2016.10.12 |
|---|---|
| 앗싸! 거기 그림이 없으니까 게시판마다 글 고치는 거 식은 죽 먹기네 (0) | 2016.10.10 |
| 개가 천원 물고 절로 갔던 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0) | 2016.10.04 |
| 이 노릇 '눈 가리고 아웅!'인데 괜찮을까? (0) | 2016.10.01 |
| 어여쁜 치약 그 품격을 더 높이고자 했습니다. (0) | 2016.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