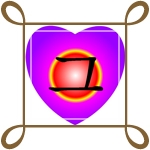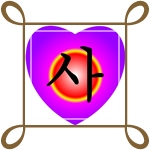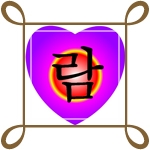곰팡이 자글자글한 식빵을 구워 먹었는데 괜찮으려나…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밤놀이하다가 새벽 네다섯 시쯤이면 은근히 배 고팠습니다.
그쯤에서 거실 나가보면 전엔 요기할 만한 그 뭔가가 있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라면이나 국수 있으면 땡이었는데…
어제부로 그 둘 다 바닥났으니 오늘은 살짝 걱정이었습니다.
네 시를 조금 넘겼을 시각에 무턱대고 거실로 갔지요.
그전 어머니 말씀 중 빵조각이 여러 군데 굴러다닐 거라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 기대를 안고 나가긴 나갔답니다.
막상 나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멀쩡하고 튼실한 놈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 나가는 동생의 아침 식사기에 절대로 손대선 안 될 거였죠.
하여 베란다 창문을 열고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데 마침 어머니께서 나오십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셨나 봐요. '엉? 잘 주무셨어요? 뭐 좀 먹으려고요~ 전에 언젠가 빵 쪼가리 굴러다닌 다면서요?'
'안 보인데 그게 어디가 있어요?' '응? 거기 베란다로 나가봐! 보일 거야~'
아닌 게 아니라 손바닥만 한 게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모양새로 식빵 봉투에 담겨서 둘둘 말렸네요.
어머닌 들어가시고 나 홀로 남아서 훤한 데로 가져와서 풀어봤지요.
'어허^ 이걸 먹어도 될까?'
식빵을 빙 둘러서 까무잡잡하게 곰팡이가 자글자글합니다.
제 또래(오십 대 중후반의 대한민국 국민)로 전에 좀 덜 살았던 분들은 모두가 경험했을 거예요.
식빵이나 과자 부스러기 혹은 알사탕 같은 것에 곰팡이 좀 폈다고 해서 절대로 그 음식물 내다 버리지 않았다는 것^ 말입니다.
먹는 음식 내다 버리는 것 자체가 죄악이었을 뿐 아니라 그런 부류의 음식이라면 평소엔 쳐다보지도 못했을 대단히 존엄하고 귀한 존재였으니까 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입으로 물어뜯어 뱉어내고 혀로 핥고 빨아서 흙먼지 같은 것도 발라내고 마치 생선 가시를 발라내듯 조심스럽게 주어 삼켰던 걸 기억해 내실 겁니다.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육칠십년대 고무신 한 짝으로 몇 년씩 버티며 살아야 했던 그 모자란 삶을 꿀단지 모시듯 귀히 여기며 살았던 분들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 시절보다는 한참 나아졌잖아요? 아직도 그런 궁상에 절었을 수만은 없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딱 그 순간의 제 처지가 무척 궁색해졌습니다.
싱크대 칼집에서 길쭉한 칼을 꺼내고 커다란 도마도 폈지요.
제아무리 배가 고픈들 곰팡이 덕지덕지 붙은 그대로는 도저히 용기를 못 내겠데요.
하여 식빵을 도마에 올리고 너무 심하게 슬어서 아예 시커먼 한 쪽부터 먼저 아주 얇게 도려내려고 했습니다.
식빵이 모두 네 장으로 네 겹입니다. 2, 3mm 정도의 아주 얇은 각만 잘라내려고 했는데 그까짓 걸로는 태도 안 나겠어요.
그래서 그 처음을 거의 10mm나 되게끔 한쪽 가상을 잘라냈거든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잘라냈다간 먹을 게 하나도 없을 거 같았습니다.
대번에 프라이팬을 꺼내 들고는 거기 기름기가 약간 있기에 가스레인지에 올린 뒤 굵은 소금을 약간 떨궜지요.
'이놈의 곰팡이들 열 받아서 죽어라!!!'
두 장을 먼저 구웠습니다. 2~3분을 이리저리 굴렸더니 곰팡이 자국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 둘을 꺼내고 나머지 둘을 구우려는데 기름기가 다 빨려버렸는지 자칫 잘못했다간 다 태우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덜 구워졌는데도 그 둘을 들어내고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살짝 발랐답니다.
그런 뒤 나머지 둘을 구웠는데 요놈들은 제법 노랗게 운치마저 감돕니다. 하여 기름을 몇 방울 더 떨구고서 아까 굽다가 만 식빵을 올려서 마저 구웠네요.
드디어 쟁반에 챙겨서 컴퓨터 책상으로 가져왔지요. 제가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면 어쩌면 이 빵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맛있데요. 이따금 소금 알갱이 주워 먹었는데 고소하면서도 너무너무 짭니다.
그것 먹으면서는 아주 옛날 생각도 났지요.
사오십 년 전 산중에 살 때 이야긴데요. 우리 집에 주어진 권리라곤 남의 땅에 무허가 집이었다지만, 그 당시엔 그 게 우리 집인 줄 알았었고요, 집 앞으로 남의 산자락을 깎아 만든 커다란 밭이 확실히 우리 처지가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왜냐면 해마다 어느 철이 돌아오면 엄청나게 많은 떡 고기를 비롯한 제사 음식을 준비해서 멀리 가져가곤 했었는데 그 게 그 밭을 공짜로 짓는 대신 그 산 주인댁에 무슨 시제를 모셔야 한다는 거였으니까 말입니다.
그 시제를 끝내고 돌아오면 어떨 땐 엄청나게 짜면서도 딱딱했던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 고기를 상어라고도 했던 것 같았는데 우리 입맛에는 꼭 커다랗고 오래된 나무껍질 같기도 했고 말라 비틀어진 버섯을 씹는 기분이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엄청 짜면서도 고소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 때문에 그 옛날 시골에서 땔나무 하러 다녔을 때가 문득 떠올랐지요.
우리에겐 돌봐주는 산이 너무 작았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만 갖고서는 한 해를 다 지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 주인이 따로 있는 산을 떠돌았는데 엄연히 그 수목 채취의 권리가 없었으니까 겨우 얻을 수 있었던 건 우거진 수풀이나 잡목 또 하나는 나무 베고 난 자리의 그루터기가 다였습니다.
그럴 때 베낸 자리가 오래된 커다란 소나무 그루터기를 곡괭이로 파보면 어떤 곳에선 그야말로 기가 막힌 것이 나무뿌리에 붙은 걸 찾아내곤 했습니다.
그 나무뿌리에 그 속이 새하얗게 두리뭉실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푸석푸석한 돌멩이 같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버섯 같기도 했던 그것!!!
그런 거가 있었습니다. 어린애 주먹만 한 거에서부터 큰놈은 어른 주먹만 했던 그것이 이 글 쓰면서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당시엔 분명히 그놈의 이름이 있었으며 무슨 약재로 쓴다고도 했는데 동무들 여럿이 나무하러 갔다가 그것 누군가가 캐내면 횡재했다고들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해서 얼른 어머니한테 가서 물었더니 어머니도 잘 모르십니다. 나무가 썩어서 그리됐거나 버섯이라고 그러네요. 내 참 그 이름만이라도 기억나면 참 좋았을 것을…
~ 식중독균 썩 물러서거라! ~
다섯 시가 조금 못되어서 문제의 그 곰팡이 식빵을 훌러덩 비웠는데 아직(오전 10:36 2016-10-30)도 몸에 특별한 신호가 없는 걸 보면 식중독균이 졸아서 튀었나 봐요.
지금에야 제 몸뚱어리 이리 형편없어도 그 옛날엔 한 건강했었거든요.
아아~ 그립습니다. 지게 한가득 푸나무 그루터기 실었으면서도 너무나도 강단지게 채우고 실어서 그 짐 모양새 정말 꼼꼼하고 예뻤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집으로 들어가 보면 집 뒤꼍 처마 밑으로 빙 둘러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네모 반듯이 쌓아둔 땔나무를 만날 수 있었지요.
더군다나 친구 선친께서 목수셨기에 그 빈틈이 털끝만치도 없었던 그런 친구네 집이었어요.
친구야~ 보고 싶다!!!
'짙은 녹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잘하면 오늘 내 일자릴 구할지도 모르겠어^ (0) | 2016.11.01 |
|---|---|
| '우리'의 대통령을 다시 뽑자 (0) | 2016.11.01 |
| 카드도 없는 놈이 국수 좀 사려니까 참 고달프네! (0) | 2016.10.29 |
| 방명록 빼는 거 말도 마라! (0) | 2016.10.28 |
| 읔! 이거~ 누가 보면 어쩌지? (0) | 2016.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