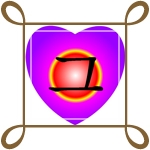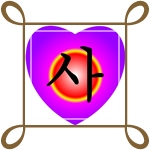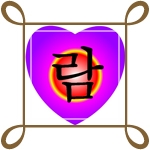운동이냐 노동이냐? 그 둘을 도대체 뭐로 구분할까?
며칠 전 이야긴데 그러잖아도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님 기일에 어떻게 할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말 할 것도 없이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떡할 거냐고 문자를 띄웠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잘 지냈다며 답글이 들어왔습니다.
당황해서는 깜빡했느니 어쩌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대답해주고는 얼른 바탕화면에서 달력을 쳐다봤지요.
그리고는 기일이고 뭐고 그런 날들은 주로 음력을 쓴다는 것도 그때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양력으로는 아직도 그날이 멀었는데 말이에요.
오늘(2014-09-20)은 며칠 전부터 가보기로 했던 아버지 산소에 기어이 찾아가기로 작정했어요.
아침나절은 할일도 없이 뭐가 그리도 바빴던지 어느새 12시가 돼버렸데요.
서둘렀습니다.
집에서 아침 떴다가는 오늘 중으론 또다시 못갈 것도 같기에 차라리 아침을 아버지 산소에서 들기로 작정했지요.
마침 어머니가 곁에 계셨기에 그 얘기 전했더니 플라스틱 반찬 통에 도시락이랍시고 밥 몇 덩이를 담아주셨지요.
자전거 안전 가방으로도 가끔 쓰는 멜빵 가방이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더 두둑해졌습니다.
도시락 밥통에 비밀봉지에 담은 김치쪼가리에 마른 김 한 봉지 그리고 아버님 산소에 올릴 사과며 과자(?) 소주에 보온병의 물통 등등이 들어차니 제법 볼록해졌습니다.
아버님 계신 그 자리(영락공원)를 자전거로 트래킹 하는 운동코스로 잡고서 일주일이 멀다않고 나다녔던 때가 엊그제 같았건만 이렇게 찾아간 것이 벌써 몇 달 만에 처음인성 싶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실은 얼마 전에 지름길로 찾아 나섰다가 길만 잃고서 혼쭐이 났었거든요.)에 나선 길이라서 조심스럽기도 했고요, 온몸이 부서질 듯 힘들 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리 먼 길도 아닌데 몸이 으스러진 느낌…….
Father-01
집 나와서 쉬지 않고 죽을힘을 다해 달렸는데 드디어 목적지가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숨이 헐떡거리고 쉬운 말로 입에서 단내가 풍길 정도(냄새를 못 맡으니까 단내라고 할 수야 없지만, 끈적거리는 그 무엇이 목에서 기어 올라와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는 그런 미적거림?)가 됐을 즈음에 드디어 자전거를 세우고는 숨을 돌려서 한두 방을 내리찍고는 또다시 달려갔어요.
Father-02
Father-03
드디어 아버님 자리 맨 밑동에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저의 전용 주차장(?)이었는데 요 아래로 50미터 가량을 너무도 지쳐서 끝내 타지 못하고 끌고 왔지요.
Father-04
그리고 후들거리는 다리 겨우 붙들고는 연이어서 계단을 탔답니다.
자꾸만 흐느적거리면서 쓰러질 것도 같았는데 무슨 오기가 뻗쳤던지 절대로 멈추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문했지요.
'이게 과연 운동이야? 죽기 살기로 하는 노동이지!!!'
차릴 것도 별로 없지만 가져간 것 다 차렸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먹을 도시락까지도 차렸습니다.
제가 파출소에 잡혔을 때마다 제 보는 데서 손발을 빌지는 않았지만, 피눈물이 나도록 봐달라고 읍소하시던 아버님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쓰러져서 결국 돌아가시고 난 담에야 겨우 이미 식어버린 그 용안 대했던 저였거든요.
죄송하지요. 정말이지 죄송하지요.
뭐라도 차려놓고 싶었습니다.
술잔 올리고 마침내 절하고 나서야 오늘 여기 오면서 맨 처음으로 진정한 두 다릴 뻗고서 쉬었답니다.
십분 남짓 지났을 무렵에 마지막 술잔 올리고 나서는 제 먹을 것 빼내서 드디어 저도 아침 겸 점심을 그 자리에서 해치웠네요.
저는 술을 안 하니까 아버님 자리에 모두를 비우고는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그 모두가 벗(?)이라는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려놓으면 모두가 다 똑같은걸…'
내가 진 모든 것 내려놓으면 살면서 갖게 된 그 모든 것이 짐일 것도 같았습니다.
부와 명예 이런 허접한 것 말고도 그 흔한 자신의 이름마저도 하다못해 영혼이라고 말하는 그 지극한 존재마저도 그 모든 것 내려놓은 마당에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런 느낌 탓으로도 거기 그 모두가 아버님의 벗 또 당장은 아니겠지만, 장차 저의 벗이 분명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Father-05
갈 때는 아버님 찾아가는 것이 최우선이었었기에 그 모든 것 팽개치고서 앞만 보고 달렸기에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돌아오면서는 그것이 몇 백 미터나 되는지도 모르게 2차선 좁은 도로에 줄지어 정차한 차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처음엔 저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무척 당황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차들이 늘어선 갓길을 잘 요리하면 빠져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 맞아. 내 차는 자전거잖아!'
그렇게 그 자리 비틀거렸지만, 조심조심 또 조심해서 결국은 빠져나왔는데 그 복잡한 상황 벗어나자마자 차들이 달리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그곳 다리를 편도로 막아놓고 공사하기에 오가는 길차들이 교대로 통과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지요.
그러고 보면 그 곡 처음 지났을 때도 그 처지가 같았을 텐데 제가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따위가 관심 밖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Father-06
집에 들어와서는 타고 갔던 자전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씻어내고는 곧바로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참이나 자고 났는데 밤이 무척 깊어졌네요.
어쩌면 이 글이 오를 때쯤엔 자정이 넘어버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오후 11:30 2014-09-20)은 아니거든요.
글꼴 다듬고 사진 올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짙은 녹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현실적으로 인터넷에서 내려받는 속도 초당 4MB가 가능할까? (0) | 2014.09.26 |
|---|---|
| 아따 내 아들놈 복무기간이 제일 기네 (4) | 2014.09.22 |
| 난 그 게 아닌데… (0) | 2014.09.20 |
| 이미 출석 체크하셨습니다. (0) | 2014.09.19 |
| 요놈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0) | 2014.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