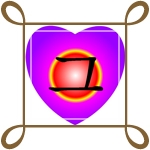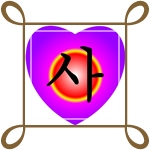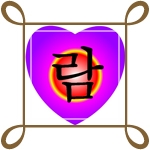야 이놈아 너 여기 있다가는 죽어~ 어서 들어가!
간다 간다 하면서도 바람 빵빵하게 채웠던 때가 언제인데 여태 나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오후 느지막한 시간에 문득 그 다짐이 닥치는 겁니다.
허드레로 입은 헐거운 운동 바지 입은 채로 위쪽으로는 그래도 추울 테니까 두툼한 걸 하나 걸치고는 무작정 밖으로 나갔어요.
찔러보니까 아직도 바람 빵빵한 거 같아 안심입니다.
오후 네 시를 넘어버린 시각이라서 그 시각에 친구 아버님이 누워계실 영락공원까지 가기엔 너무도 늦었습니다.
하여 담양 쪽으로 가기로 했지요.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 출발점은 집을 나와서 영산강 둔치에 이르고 거기 둔치 길을 따라서 계속 달리다가 어느 시점에서 서로 갈라서야 하는 도정입니다.
그 결정도 실은 집 나와서 한참을 달리다가 이리저리 셈해보고서 내린 결정이에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말이 달린 거지 다른 사람 눈엔 한가하게 노닥거리는 거로나 보였을 그런 산책입니다.
자전거 두 대가 겨우 비킬 정도의 좁다란 둔치 길에 새까만 그 뭔가가 디귿 자로 몸을 비틀고 있습니다.
그 자리 지나치면서 아무리 봐도 저건 분명 산 생명이었어요.
하여 냅다 자전거 돌리고는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건넸지요.
'이 녀석아 너 왜 이러고 있어? 야 이놈아 너 여기 있다가는 죽어~ 어서 들어가!'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지나치면서 얼핏 짐작한 대로 그것 뱀이었습니다.
1m는 조금 아직 안되고 8, 90cm쯤 되는 크기입니다.
돌아와서 그렇게 말 붙였더니 그제야 스멀스멀 기어갑니다.
가끔은 도로 폭이 2m도 안 될 그 좁은 둔치 길로 차를 몰고 오는 정신 없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순간 제가 몰던 것이 자전거가 아니고 차였다면 틀림없이 요놈 로드킬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놈입니다.
요놈 제 말뜻 알아듣기라도 했는지 어느새 풀숲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 밤 깊은 마포종점 - 01 ~
뱀을 그렇게 보내놓고 한참을 더 달리니까 드디어 광주시와 경계를 이루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 밤 깊은 마포종점 - 02 ~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영산강 8경 중 하나인 담양 대나무숲이 나옵니다.
~ 밤 깊은 마포종점 - 03 ~
예전에도 이따금 찾았던 곳인데 저의 최종 목적지가 여깁니다.
~ 밤 깊은 마포종점 - 04 ~
~ 밤 깊은 마포종점 - 05 ~
머리 허옇게 센 자국도 늘어났고요, 저도 인제 제법 늙었습니다.
~ 밤 깊은 마포종점 - 06 ~
자전거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 좀 썼을 테고요.
여기까지 들어오자면 시멘트 둔치 길이 마치 제주 분화구 전시회라도 연 거처럼 길 곳곳이 1m도 안 될 간격으로 움푹움푹 패여서 그건 필시 오름을 널어놓은 것 같은 고난도의 길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그 분화구 오름 길에도 갓길 쪽으론 그런대로 괜찮은 부분이 많은 데 그1 쪽은 또 자갈이 널렸기에 그 자갈에 언제 미끄러져서 둔치 언덕 밑으로 구를지도 모를 험로기도 해요.
그랬으니 자전거 통통 튀면서도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먹었겠습니까?
~ 밤 깊은 마포종점 - 07 ~
돌아오는 길엔 길옆 어느 부위에서 그 무언가에 깜짝 놀랐답니다.
그 자리에 나무가 우거지지도 않았는데 꼭 다람쥐를 닮은 녀석이 제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전에 어등산을 다녔을 적엔 산 곳곳에서 청설모를 만났었는데 그놈은 주로 짙은 녹색을 띠었었거든요.
근데 요놈은 노란색도 아니고 갈색이었습니다. 또다시 되돌아보면 고양이처럼도 생겼습니다.
했는데, 그렇게도 빠른 몸동작이며 저 좁은 구멍으로 눈 깜짝할 새에 들어간 걸 보면 이는 족제비거나 다람쥐가 틀림이 없습니다.
제 아주 어렸을 적엔 족제비가 우리 집에 염소 새끼도 채가고 키우던 병아리도 채갔다는데 사실 제 기억엔 없습니다.
~ 밤 깊은 마포종점 - 08 ~
오면서 그것 말고 염소도 봤답니다. 세 마리나 있습니다. 그것 세 마리 모두를 사진 한 방에 다 담으려는데 무척 어렵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면서 그놈 염소 울음소리 들었을 땐 저도 따라 하려고 '뮈에에~'해봤지만, 진짜 염소 소리가 안 났습니다.
그때야 또 깨달았지요. '아 맞아! 난 혀가 굳어서 염소 소리 같은 거 낼 수도 없었지!!!'
그래요. 맞습니다. 혀가 굳었기에 숱한 뇌 질환자 대부분이 그렇듯이 저 역시도 말을 제대로 못 합니다.
한가할 때나 느긋할 때면 어떻게 차분히 말(단어)을 만들어내지만, 급하거나 다급해지면 이건 차라리 병신 쪼다가 돼버리기에 수화라도 배워둘 것을 하는 맘이 급조되곤 했었다네요.
아차! 그리고 날 궂을 땐 반드시 안경을 끼고 나갔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기에 오늘 날파리한테 옴짝달싹 못하고 정말 혼났습니다.
'짙은 녹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딱 그 순간부터 이미 LG가 가장 마지막을 장식해주기 바랐습니다. (0) | 2016.10.21 |
|---|---|
| 그렇다면 '졸업축하금'이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 같은데… (0) | 2016.10.21 |
| Moo0(무영)의 시스템 모니터를 바탕화면에서 늘 보기 (0) | 2016.10.19 |
| 언젠가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0) | 2016.10.17 |
| 내 자전거 살짝 꾸몄더니 괜찮아진 거 맞네!!! (0) | 2016.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