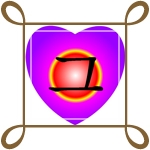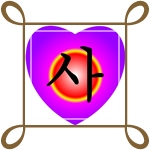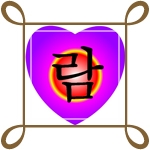와! 장치 관리자 깨끗해졌다!!!
모니터 두 개를 쓰는데 그 한쪽에서 쓰는 키보드가 언제부턴가 불량해졌다.
집안 곳곳에는 쓰지 않는 여분의 키보드가 많다.
그 대부분이 이번에 불량해진 키보드처럼 '특정 키가 안 눌러진다든지', '연속하여 엔터키 치는 모양새'를 보이곤 했기에 버려야 했는데도 차마 버리지 못한 것들이다.
또한, 그 대부분이 일만 원대 이하의 저가 물건인데 어떨 때 써보면 또 괜찮기도 했기에 고장 난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놈들이었다.
그랬든지 말았든지 또다시 새 놈 살 것이 아니라면 개중에서 어떤 거라도 꽂아보고 제대로 작동하면 그걸로 쓸 요량이었는데-
무슨 까닭에 그랬던지 USB 포트에 꽂는 순간부터 '뚜뚜 두' 한 뒤로 무반응이다.
키보드에 불(LED)도 안 들어오고-
[컴퓨터 관리 / 장치 관리자] 쪽엔 당연하다시피 [알 수 없는 USB 장치 어쩌고저쩌고-]가 뜬 채 말이다.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얼마나 설쳤는지 몰라-
이리저리 포트도 바꿔서 꽂아도 보고-
다른 키보드로 바꿔서 끼워도 보고-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서 그 작업 또다시 반복해 보고-
이렇게 만으로 하루를 지나는 중이었는데-
[혹시 USB 선이나 포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좀 전에 문득 생각이 그쪽으로 박힌다.
USB 연결선이 5미터쯤 되는 긴 선인데다 이것도 또 컴퓨터 본체에 달린 포트가 아니라 메인보드에서 직접 뽑은 두 포트 중 하나였기에 그런 의심이 들었던 거다.
그런 의구심으로 본체를 돌려서 USB 포트를 들여다본다.
그것 중 하나에 '1To3 포트'와 연결하여 하나는 지금 연결되지 않은 '키보드 포트'로 또 하나는 '동글이 포트'에 나머지 하나는 빈 상태였기에 그 자리에 계속해서 키보드를 꽂아본다.
'뚜뚜 두' 소리를 들으면서도 모니터에서 장치 관리자를 계속해서 주시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에 작업표시줄에 '컴퓨터에 고장이 있다'라면서 수리할 걸 요구하는 팝업이 떴다.
'Advanced SystemCare'에서 보내는 메시지다.
특별히 달리 할 것도 없으니 그걸 눌러서 수리하고는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켰다.
그러고는 깊숙이 박힌 키보드를 꺼내서 그놈으로 해보려는데 그것 빼면서 주변이 어질러졌지.
놈이 깊숙이 박혔던 놈이니까 당연히 어질러졌을 텐데 기분이 찜찜하더라.
어질러진 그것 깔끔하게 정리·정돈한 뒤로 키보드를 들고서 그 자리가 아닌 최종적으로 쓸 5미터 연장선의 가장 끝에 그걸 박아봤지.
- 어^ 왜 이렇게 조용해! 소리도 없고^ 혹시 인식이 안 된 거 아닐까? -
얼른 알아보려고 그 자리 모니터를 켜서 '컴퓨터 관리(로컬)' 링크를 눌러본다.
일절 사족이 없이 깨끗하다. 내친김에 '장치 관리자' 눌러봤다. 어^ 역시나 깨끗하다.
인제 이렇게도 깨끗한 키보드에서 확인할 차례다.
가장 먼저는 'Num Lock' 버튼을 눌렀다. 드디어 led가 들어온다. 오호라~ 야호!!!
지금에서야 'Caps Lock'도 신경 써서 눌러보련다.
이미 이전에 눌렀지만, 신경을 안 썼기에 그 불(led)이 들어왔는지 그건 아직 모른다.
'쉭!' - 오^ Num Lock' 옆으로 두 개의 불이 들어오네!!!
그나저나 이번에 꺼낸 키보드엔 '키스킨'도 덮였다.
어찌 보면 이건 꿩 먹고 알 먹고다.
아이~ 좋아라~ 흐흐.
좀 전에 어머니 아침 차려드리면서 웬 과자가 집에 있냐고 물었더니 동생이 사다 놓은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어제 사 오셨단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 말이다.
기적 같은 이야기다.
우리 어머니가 나 주려고 과자 샀던 기억은 너무나도 멀다.
1970년도 이전 우리가 산중에 살 때나 있었던 이야기다.
그 산중에서도 우리 집에선 '김 양식'을 했었다.
아랫마을 사람들이 했던 거처럼 대량으로 했던 게 아니고 모든 기구·공구·어구·기술이 없어서 그랬던지 아주 소량 / 소량도 많다 극소량으로 했었다.
아랫마을 분들이 하루에 삼사십'톳'을 했을 때 우린 서너'매'를 하는 정도였겠다.
※ 김을 세는 단위: 한 장 / 열 장(한 매) / 백 장(한 톳) / 만 장(한 궤)
그때 만든 김을 팔고 왔을 때나 간신이 과자가 있었다.
그 시절의 과자로 삼베나 비가가 다였었는데-
다른 동생들에겐 사줬을지 몰라도 내겐 오십여 년 전 그때 이후로 처음이리라.
그 시절 71년도에 바닷가로 이사했었다.
아까 컴퓨터를 재시작하기 전에 너튜브에서 '병을 쉽게 자르는 방법'이라며 어떤 영상이 올라왔더라.
그걸 보는데 너무나도 복잡하더라.
그 방식으로 자르면 대량으로 자를 수도 있겠고, 일정한 크기로 자를 수도 있을 거며 또 안전하겠더라.
다른 방식으로 이미 해봤기에 관심을 뒀거든-
71년도 그때였어.
산중에서는 빈 병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그 바닷가에선 흔했거든.
'태풍'이라도 불어닥치면 집이 떠내려갈 수도 있었기에 불안했어도 그게 그치면 담장 너머 바닷가로 온통 쓰레기 천지였지.
그 쓰레기엔 온갖 것들이 넘쳐났는데 개중에 빈 병도 수두룩했었지.
어느 날은 그 쓰레기 틈바구니에서 빈 병(두 홉짜리 소주병이나 콜라병 등) 몇 개를 주워 왔는데 먼저는 소주병 가운데쯤에 굵은 명주실을 스무 바퀴쯤 칭칭 감고는 그 실 위로 석유를 따라와서 흥건하게 적시는 거야.
그런 다음 석유 적신 실에 불을 붙이고 활활 타오르도록 십여 초를 둔 뒤 그 병을 명주 장갑 낀 손으로 잡고서 딱딱한 나무토막 등에 살짝 치면 '툭!' 조용히 두 동강이 났었지.
그렇게 자를 병을 '꽃병'으로 쓴다는데 그러려면 소주병으로는 모양이 안 나잖아!
하여 콜라병으로 해보는데 그건 잘 안되더라. 그건 실패했어.
그것 말고도 어린이 세발자전거를 닮은 '세 발 구르마(나무 자전거)'도 만들었었지.
소나무 밑동이 Y 형태로 벌어지면 목재로서 그다지 상품 가치가 없었거든.
그래서 그런 나무를 찾으려고 또 베어내도 야단맞지 않을 곳(박정희 정권 때 삼림이 얼마나 커다란 존재인 줄 알았기에)을 찾아서 온 산을 다 헤맸지.
내가 산에서 내려왔기에 산 타는 건 별것도 아녔지만, 그런 나무 찾기가 무척이나 어렵더라.
겨우 찾아서는 그 나무가 있는 자리 바닥을 다 긁어낸 뒤 톱질을 시작했는데 그 낮은 자리에서 하려니까 그 역시도 어렵더군.
왼편으로 자르고 / 오른편으로 자르고….
그렇게 나무 자전거 몸통을 준비하고는 바퀴(앞바퀴 하나, 뒷바퀴 두 개)로 쓸 통통한 나무도 자르고, 운전대로 쓸 Y자 나무도 따며, 뒷바퀴가 들어갈 자리 축도 다듬고….
바퀴마다 구멍을 내서 축에 끼우고 그 바퀴가 빠지지 않게끔 축 끝에 못을 쳐서 턱도 만들고….
그렇게 만든 나무 자전거-
거의 같은 시기에 산중에 살았던 오두막 셋이 자리를 떴건만, 미처 뜨지 못한 곳에 우리 큰댁이 있었다.
그 큰댁에는 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내 나무 자전거를 부러워하네.
하여 녀석이 가진 화약총과 나의 나무 자전거를 서로 바꾸는 방식으로 쿵짝했지 뭐니?
그해가 1971년 아홉 살의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
그곳 아랫동네에 들어가니까 내 친구들은 다들 초등학교 1년 선배들인데 그 선배 중 절반은 또 나보다도 어리지 뭐야.
걔들은 일곱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니 말이지.
사람 인연은 정말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
내 고등학교 시절에 한 살이 낮은 그 녀석은 영원토록 내 고등학교 선배가 돼버렸고 또 촌에서 소 꼴 베다가 학교에 들어왔다는 나보다 다섯이나 많은 중학교 때의 나의 1년 선배님은 고등학교선 같은 학년으로 동년배가 돼버렸어!
사람 팔자도 모를 일이다.
평소 그토록 씹었던 그 면상이 언제 나의 사돈으로 다가올는지는 정말이지 모를 일이다.
그러니 매사 조심하자. 신중해지자!
~ 사랑 ~

'짙은 녹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PD수첩 - R&D 예산 삭감 미스터리 (0) | 2024.01.12 |
|---|---|
| 야호! 업데이트 취소하지 않고 재시작 한방으로 정리했다.^!^ (0) | 2024.01.11 |
| 네이버에서 '콩' 받으려고 이 글을 쓴다. (1) | 2024.01.10 |
| 페이스북 글자 색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어 흐뭇하다. (0) | 2024.01.10 |
| 내 그럴 줄 알았지^ 허! 내 참!!! (0) | 2024.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