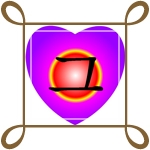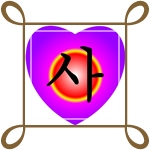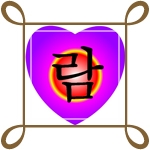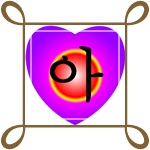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너무나도 아름다운 밤 이야기!
초저녁에 인제는 출가하여 따로따로 사는 동생 둘이 집을 찾았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하면서 노닥거리는데, 개중에 큰 녀석이 밥 먹자고 부른다.
시끌시끌했기에 누군가가 와 있을 거로 짐작했었는데 나가보니까 여동생도 함께 와 있더라.
그렇게 하여 대충 걸치고서 나갔는데 삼겹살 구워 먹자고 한다.
전기 프라이팬에 구워대던데 참으로 맛나더라.
이것이 아침이야! 점심이야! 저녁이야!
규칙적인 식사가 정답일 텐데도 몸 따로 마음 따로다.
그래도 거르는 날 거의 없이 매일 한두 끼는 꼬박꼬박 챙기는 편이라서 체중 유지(80kg대)는 거뜬하다.
늦은 시각에 먹었으니, 동생들과 함께한 이 끼니를 저녁으로 치고-
반바지로 탁자에 앉아서 먹다가 곁에서 돌아가는 선풍기 탓에 추워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랬기에 얼른 방으로 들어와서 반바지 위로 겨울 내의 하나를 끼우고서(쭉쭉 늘어나는 스판덱스 재질의 옷)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식사를 마저 끝냈었지.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으로 돌아오면서 '잘 먹었다' 하고 띄운 뒤 큰동생 어깨 짚으면서 '고맙네. 동생!'
컴퓨터 책상에서 또다시 그 무언가(Windows 11 설치 디스크 만드는 중) 노닥거리는데 여동생이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다.
'우뭇가사리로 만든 묵'을 미숫가루 탄 맑은 찬물에 띄운 시원하고 고소한 '냉차'다.
어렸을 때 갓 지은 밥 퍼낸 뜨거운 가마솥에 부은 물이 저절로 조리됐던 '숭늉'과도 함께 이런 부류의 '마음 익히는 음료'가 여럿이었는데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맛보니까 어린 시절의 추억이 피어나 그 맛이 새롭더라!
사는 집이 바다와 가까우면 태풍철만 빼고 나면 건질 것이 참으로 많았다.
우리 마을 해변은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대략 50~100m 사이의 바닥이 마을 중심에 난 선착장을 중심으로 왼쪽은 주로 모래밭이었고 그 왼쪽은 개펄이었고 오른쪽은 대략 200m가량이 굵은 돌이나 바위를 닮은 암석으로 채워져 그곳을 우린 '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오른쪽은 또 순전히 개펄이라서 바다풀인 '갈대' 말고 '잘피'가 흔했었다.
그 바닷가에서 그물이나 통발을 깔아두면 걸이 있는 쪽에 고기나 해삼, 게가 많았고 갈피가 많은 뻘밭에선 주로 장어나 낙지가 잡혔었다.
그곳에서 간만의 차가 클 때는 바닷가를 돌아다니며 맨손으로 그것들을 잡았고 나머지는 작은 목선에 그물이나 통발을 싣고 다니며 바닷일 했었다.
바닷일은 매번 홀몸으로 했었으니까, 그날그날의 '조류 흐름'을 모르고서는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으리라!
그건 그렇고 어느 한 밤중에 연안에 목선 띄우고 조업할 때 뱃전이나 노 또는 손바닥이나 팔, 낚싯줄, 통발에 우수수 떨어지는 그 화려한 불빛들!
아주 가끔은 밤중에 수심 3~4m쯤의 연안에 배를 띄우고 닻을 내린 뒤 그 자리서 장어낚시를 했거든.
실력자들은 하룻밤에 보통 너덧 뭇(한 뭇: 열 마리) 정도 낚는데 나는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게을러서 그런지 한 뭇마저도 채우기 힘들었었다.
그런데 그런 바다에서 발광물질을 만나면 꼭 살아있는 생물이 몸을 타고 흐르는 거 같기에 살짝 무섭기도 하더라!
그 물에 손을 뻗어도 팔을 뻗어도 물장구를 쳐도 그 불빛이 솟구쳤으니까-
-----------------------------------------------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학명: Gelidium amansii)는 우뭇가사리과에 속하는 홍조류의 해조류이다.
바닷말의 일종으로 주로 한천의 주원료로 이용되는 바닷말을 가리킨다.
여러해살이 해조류로서 여름의 번식기가 지나면 본체의 상부는 녹아 없어지고 하부만 남아 있다가 다음해 봄에 다시 새싹이 자라난다.
동해안·남해안과 황해의 바깥 도서에 분포하나 동해 남부 연안의 것이 품질도 좋고 가장 많이 생산된다.
바닷속 20-30m 깊이의 바위에 붙어 자라는데, 바깥바다에 면하고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으며, 해수의 소통이 잘되는 곳에 산다.
※출처: 위키백과 - 우뭇가사리 - https://ko.wikipedia.org/wiki/우뭇가사리
비지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두부박(豆腐粕)이라 부르기도 한다.
콩을 불려 갈아서 끓인 음식은 콩비지[2] 또는 되비지라 하는데, 이를 줄여서 "비지"로 부르기도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녹두묵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비지"라 부르기도 한다.
※출처: 위키백과 - 비지 - https://ko.wikipedia.org/wiki/비지
청각
청각(靑角, Codium fragile, green fleece, green sea fingers, stag · sponge seaweed)은 청각과의 청각속에 속하는 조류이다.
청각의 몸 표면에는 '소낭'이라는 대롱 모양의 작은 주머니가 배열되어 있어서 피층을 이루며, 한편 소낭의 밑부분에서부터 뻗은 가지들이 서로 얽혀서 속부분을 만든다.
이 때 몸 전체는 격벽이 없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비세포성 체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청각은 세계 각지의 연안에 분포하며, 특히 간조선 부근의 암초에 잘 발달되어 있다.
청각 무리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중요한 종류로는 구슬청각·밀청각·말청각 등이 있다.
1년생 해조류로,어린 개체가 초겨울부터 생장을 시작한다.
늦은 봄과 초가을까지 빠르게 자라지만, 늦가을부터는 생육이 더뎌지고 한겨울이 되면 죽는다.
청각은 생물 또는 건조 상태로 유통되는데, 김치에 넣기도 하고, 냉국, 무침으로 조리하거나, 효소발효액을 담가 먹기도한다.
※출처: 위키백과 - 청각 - https://ko.wikipedia.org/wiki/청각_(생물)
미역
미역(학명: Undaria pinnatifida)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미역과의 갈조류이다.
식물과 유사하지만, 분류상으로는 식물이 아니라 원생생물에 속한다.
무기질, 비타민 및 섬유질 성분, 점질성 다당류, 아이오딘을 함유하고 있어 식용된다.
중국과 일본, 한국 등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이용되는 식품으로, 한국 기록에는 고려 시대인 12세기에도 먹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중국 기록에는 8세기에 이미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등 오래전부터 널리 식용되었다.
한국에서는 산모에게 미역국을 먹이는 풍습도 있다.
한방에서 미역은 해채(海菜)나 감곽(甘藿), 자채(紫菜), 해대(海帶) 등으로 불린다.
※출처: 위키백과 - 미역 - https://ko.wikipedia.org/wiki/미역
매생이
매생이(Capsosiphon fulvescens, Maesaengi)는 갈매패목의 녹조류의 식물이며, 짙은 녹색에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뭉치인 것이 특징이다.
사각형의 세포가 2개 또는 4개씩 짝을 이룬다. 파래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파래보다 가늘고 미끈거린다.
※출처: 위키백과 - 매생이 - https://ko.wikipedia.org/wiki/매생이
김
김은 김속과 돌김속의 해조류를 넓은 곳에 평평하게 펴서 말려서 사각형으로 잘라서 먹는 음식이다.
그대로 먹거나 참기름을 바르고 소금을 쳐서 구워 먹는다.
주로 요리의 부재료로 쓰이며 밥을 싸 먹거나 김밥으로 만들어 먹는다.
또한 잘게 잘라 국이나 탕 위에 고명으로 뿌려 먹기도 한다.
청태, 감태, 해우(海羽), 해의(海衣), 해태(海苔)라고도 부른다.
※출처: 위키백과 - 김 - https://ko.wikipedia.org/wiki/김_(음식)
파래-01
파래는 파래속과 갈파래속, 홑파래속의 먹을 수 있는 해초류를 이르는 말이다. 가시파래와 납작파래, 잎파래, 창자파래, 참홑파래 등이 있다.
※출처: 위키백과 - 파래 - https://ko.wikipedia.org/wiki/파래
파래-02
내용
파래는 갈파래과에 딸린 바닷말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가시파래, 갈파래, 구멍갈파래, 모란갈파래, 초록갈파래, 납작파래, 창자파래, 격자파래, 잎파래, 매생이 등이 있다.
파래, 감태, 매생이, 김은 겨울철 조간대에서 자라는 해조류 4총사이다.
이 가운데 파래, 감태, 매생이는 녹조류이지만 김은 홍조류이다.
감태는 줄기가 매생이보다 굵고 파래보다 가늘다.
파래는 생명력과 적응력이 아주 강하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열대지역에서 극지대까지 자라지 않는 곳이 없다.
바닷물이 고인 곳이면 없는 곳이 없다.
『자산어보玆山魚譜』에는 ‘해태’라 했다.
“뿌리가 돌에 붙어 있으며 가지가 없다. 돌 위에 가득 퍼져서 자란다. 빛깔이 푸르다.”라고 설명했다.
해태라면 혹시 ‘김’을 잘못 적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김은 ‘해의’라는 말을 쓴다. 김을 ‘해태’라는 사용한 것은 일본이다.
그것이 일제강점기 전후 우리나라도 들어온 것이다.
『동아일보』(1938. 3. 8) 기사를 보면 해태는 조선 고전에는 ‘해의’라고 쓰고 속명으로 ‘짐’이라 칭한다고 했다.
김은 홍조류로, 색깔이 자색이나 붉은색이다.
그러니까 『자산어보』에 ‘해태’를 두고 푸르다고 한 것을 보면 파래가 맞다.
이 중에서 통상 사람들이 파래라고 하는 것은 감태로 알려진 가시파래이다.
맛이 없어 사료용으로 쓰는 갈파래를 제외하고 모두 먹을 수 있다.
특히 감태와 매생이는 남도의 독특한 맛과 향으로 유명하다.
감태는 말리면 단맛이 더욱 강해진다.
『자산어보』에 “모양은 매산태를 닮았으나 다소 거칠고, 길이는 수자 정도이다.
맛은 달다. 갯벌에서 초겨울에 나기 시작한다.”라고 했다.
이끼처럼 생긴 것이 단맛이 난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파래는 대개 민물이 들어오는 바다의 조용한 웅덩이 바위에 붙어 자란다.
종류에 따라 생육 시기가 다르지만 보통 늦가을에서 초여름까지 자란다.
감태와 매생이는 12월부터 2월까지 채취한다.
이 시기를 지나면 억세어지고 색이 변해 맛이 없다.
흔히 파래 종류를 채취할 때는 뜯는다고 하지만 감태와 매생이는 맨다고 한다.
호미로 밭을 매듯 갯벌을 맨손으로 헤집으며 채취하기 때문이다.
매생이도 양식을 하기 전에는 ‘맨다’는 말을 곧잘 사용했다.
파래, 매생이, 김은 대나무나 그물로 만든 발에 포자를 붙여 양식한다.
하지만 감태는 갯벌에 포자가 자리를 잡고 자라는 자연산이다.
우리나라 해조류 양식은 김과 미역에 편중된 탓에 과잉 생산, 품질 저하, 소비 감소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남해해양연구소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가시파래 양식을 도입해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파래는 갯벌에서 자연산을 채취한다.
김 양식이 활발하지 않은 완도, 신안, 무안, 함평 등 지역 어민에게 감태(가시파래)와 매생이는 ‘겨울 효자’로 불릴 정도로 짭짤한 소득원이 된다.
파래는 맨손으로 채취하고, 마을에 따라 공동 작업과 개별 작업으로 나뉜다.
공동 작업은 채취·판매를 모두 공동으로 하는 경우로, 완도의 고금도를 대표로 들 수 있다.
가공업자의 요구 물량을 미리 받아서 물때에 맞추어 마을 주민이 함께 채취하러 간다.
개별작업은 마을 어장이나 인근 갯벌에서 개별 채취해 시장이나 공장으로 유통하는 것을 일컫는다.
파래는 채취한 후 세척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그래서 개별 작업을 하는 지역에서도 일손이 있으면 다른 마을의 공동 어장으로 가서 작업을 하기도 한다.
파래는 무절임과 함께 조리하는 파래무침이 대표 음식이다. 이외에도 파래전, 파래냉채, 파래죽 등도 있다.
특징 및 의의
파래는 단백질·무기염류·비타민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어 건강식으로 즐겨 먹는다.
전복이나 소라가 먹고, 물고기들이 알을 낳는 해중림海中林의 하나이다.
※출처: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파래 - https://folkency.nfm.go.kr/topic/파래
-----------------------------------------------
바다의 발광물질
AI 개요
바다에서 빛을 내는 현상, 즉 생물 발광은 주로 발광 플랑크톤(야광충)이나 박테리아, 그리고 특정 해양 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빛입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물질인 루시페린과 루시페라아제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두 물질이 반응하면서 빛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밤바다에서 푸른빛으로 나타나며, 해양 생태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바다에서 빛을 내는 물질과 현상:
루시페린과 루시페라아제:
발광 생물들은 세포 내에서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을 생성하고, 루시페라아제라는 효소의 도움을 받아 산소와 반응시킬 때 빛을 방출합니다. 이 과정은 생물 발광의 핵심 원리입니다.
야광충:
바닷물에 서식하는 야광충은 파도나 물체의 자극에 의해 빛을 내는 대표적인 생물입니다. 이들은 밤바다에서 푸른빛으로 반짝이는 현상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광 박테리아:
일부 박테리아는 다른 생물과 공생하며 발광하는데, 이는 먹이를 유인하거나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타 해양 생물:
심해 어류, 오징어, 해파리 등 다양한 해양 생물들도 발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발광은 포식자를 피하거나 먹이를 유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발광 현상의 역할:
먹이 유인:
빛을 이용해 먹이를 유인하거나, 포식자를 혼란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일부 생물은 발광을 통해 동종 개체와 소통하거나 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장:
바닷물과 비슷한 빛을 내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생태계 유지:
발광 생물들은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먹이 사슬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출처: 구글검색 - 바다의 발광물질 - https://www.google.co.kr/search?q=바다의 발광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