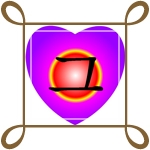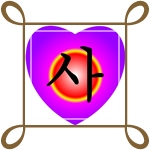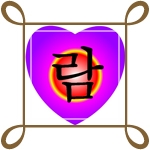- 색즉시공공즉시색(色卽是空空卽是色) -
요즘 돌아가는 세상 이치로 보면 초등학교 3학년도 됐음 직한 낫살 아홉에 나는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었지.
그해가 1971년도야.
그 나이에 학교에 가려면 나는 여러 가지를 외워야 했었어.
첫째로 일 이삼 사를 하든 하나둘셋 넷으로 하든 최소 이백까지는 연속으로 셀 수 있어야 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연이어 쓸 수도 있어야 했지.
둘째로 기역니은 디귿 리을은 물론이거니와 가갸 거겨에서 아야어여 그 끝까지 외울 수 있어야 하고 쓸 수도 있어야 했지.
셋째는 이^일은 이, 이^이는 사로 시작하는 구구단을 구단까지 통째로 외워야 했고,
마지막으로는 50M 거리에 바로 옆집에 살았던 사촌 형제지만 친구였던 개와 내가 동시에 여태 했던 것들은 등교를 위해 따라가는 책보자기가 아니라 머릿속에 장착할 기본 무기였었고 그 마지막이 강인한 기개였지.
그 기개를 위하여 깊은 산중의 오두막에 살았던 우리 친구네 집 옆으로 누군가의 다 허물어진 묘지(산소) 곁으로 제 맘대로 자라나던 우리 키 다섯 배쯤의 감나무에 올라가 그 중간쯤의 갈래 크게 벌어진 가지에 차렷 자세로 우뚝 서서 고래고래 고함쳤었지.
전체 차렷! 열중쉬어^ 전체 차렷! 대대장님에 대하여 경례!^! 충성!!!
그렇게 장착하고서 드디어 산속 오솔길을 타고 학교에 갔는데 정말이지 거긴 별천지더라.
나 말고 그 산속 오두막 골 친구 둘이나 나처럼 아홉에 들어오는 친구가 몇 놈이 더 있었는데 우리 말고 나머지 모두는 곧바로 2학년으로 격상(월반)해 버렸지.
우린 너무 외진 곳에서 나왔으니까 그대로 뒀는데….
학교 공부 싫어지더라!
얘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쓰기 / 책 읽기' 그런 따위들 이미 다 아는 글인데 그 어린 나이에 호기심이 당겼겠어?!?
학교 공부는 하는 둥 마는 둥 그저 기다려지는 건 점심시간 때나 나타나는 '빵 차(시골 촌놈에게 빵 차에서 나는 냄새 정말이지 죽였지)'가 오기만을 기다렸었어.
그러다가 하교 시간 종이 땡땡 울리면 'x 빠지게' 집으로 달려왔었지.
그 시절에 가방 멨던 놈의 우리 학교로 전근해 온 어떤 선생님 자식들 뿐이었고 우리 대부분은 책보 돌돌 말아서 배에 묶거나 어깨너머로 갈지자로 메고 그냥 뛰었었지.
집에 오자마자 어린 동생 등에 메거나 배에 단단히 묶은 뒤 소나 염소 풀 뜯기로 다녔었지.
그런 자세로 좀 더 커서는 밤이 되기 전에 꼴(여물) 베서 밤중에 짐승들 먹잇감으로 준비했어야 했어.
그렇게 크는 동안에 보리 베기, 벼베기는 기본이고 그것들 타작할 때나 콩 타작할 때 단벌 게 옷이 주류였던 그 시절 보리 가시나 볏 수염 가시, 콩 나무에 달린 그 가시들 얼마나 박혔던지 몰라.
박힌 자리 하나하나마다 살갗을 뚫고 들어오기에 그 가려움은 사오십 년이 훨씬 지난 지금 떠올려도 몸이 가려워^
너 나 할 것도 없이 우리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커왔어!
왜냐면 그래야 살 수 있었으니까.
그 시절의 곡물은 없어도 그거라도 내다 팔아야 먹고 사는 사람에겐 턱없이 싼 가격이었고 실제로 날마다 입에 풀칠해야 하니까 풀칠할 그거라도 사야 했던 사람한테는 그 모두가 금값이나 다름없었지.
그 셈법은 가진 자의 산수 셈법으로는 도저히 풀 수도 알 수도 없는, 지지리 없이 사는 땟국물 줄줄이 흐르는 프롤레타리아만이 아는 셈법이야.
--------------------------------------------------------------------------------
그렇게 저렇게 훨씬 컸던 그런데도 아주 예전에 이런 식으로 자전적 수필을 썼던 적이 있었지.
그때 그걸 읽어본 선생님께서 하지는 말 - 야! 허구가 너무 센 거 아니냐! / 그래도 수필인데???
사람을 겉만 봐서는 모르지.
누군가는 하루하루를 죽을힘 다해서 사는데 겉으로 그것이 안 보이니까 오판할 수도 있다^
그래 내가 생각해도 평범한 고등학생이 우리 사회에서 그만한 일을 겪고도 무심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거처럼 등하교한다는 게 불가능하겠어!!!
지금에 와서 선생님의 그 평판을 이해하지만, 당시엔 무척 서운하더라.
우리 살면서 누군가의 글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은근히 좋은 기운을 얻기도 하지-
또 어떤 글은 그 끝이 모호해서 계속해서 신경 쓰이기도 해 / 한마디로 찝찝한 거야-
누군가를 보면 그 자체로 이미 완전체 같지만, 그 내면 파고들면 거기도 분명 어딘가는 너무나도 빈약해서 달래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구석이 있지!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어느 모로 세워도 금세 넘어질 것만 같지만, 그를 진정으로 만나보면 그는 이미 세상 이치를 모두 깨쳤기에 해탈한 완전체로 보이기도 해!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
적어도 이런 모습이고 싶다.
날마다 조금씩 늙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늙음을 한탄하지 않고 곱게 받아들이는 놈-
누군가가 나 때문에 피해 본 것이 사실이라면 어떡해서든 그 피해를 더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놈-
그 옛날 [전원일기]가 그 회차에 묶인 매듭을 그 회차가 끝나기 전에 풀었듯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사는 놈-
그런 놈이 되고 싶다.
애초 그만큼의 됨됨이가 못 됐지만, 그러려고 노력하고자 한다.
이 순간에 갑자기 한때 매우 좋아했던 구절 하나가 떠오르네.
- 색즉시공공즉시색(色卽是空空卽是色) -
지금은 여기서 끝^
'짙은 녹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손가락이 부르텄다면 고무장갑이라도 낀 채로 덤비자! (0) | 2023.01.05 |
|---|---|
| 하드디스크 종류와 그 연결 방식은 별개다! (0) | 2023.01.04 |
| KBS 'UHD 환경스페셜'을 보면서 별것들 다 알아갑니다. (0) | 2023.01.03 |
| 티스토리 - 관리자가 삭제했다지만, 내가 영원히 삭제합니다. (0) | 2022.12.31 |
| 츄리닝 바지의 허리춤 고무줄이 자꾸만 터집니다. (0) | 2022.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