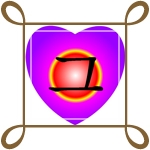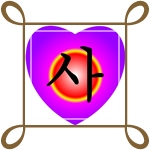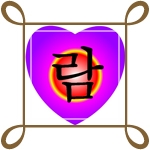결국은 뭐든지 다 지나가는 거지 뭐!
핸드폰에 들어온 어떤 문자를 지우려다가 문득 옛 생각이 났습니다.
그 문자라는 게 그 옛날 다녔던 고등학교의 총동문회에서 어떤 계기(이번엔 부부의 날과 관련해서)가 있을 때마다 짬짬이 보내는 문자인데 마누라도 없는 제겐 더더욱이 무의미한 문자였지요.
문제는 그것 지우면서 그 옛날 잠시나마 친하게 지냈던 한 동문이 떠올랐던 겁니다.
고향이 영암이었던 녀석이었는데 무척 자기의식이 강한 친구였어요.
요즘 와서는 '아르바이트'란 말이 사방팔방에 도배됐지만, 그 시절(80년대 초)엔 그리 흔한 단어는 아녔답니다.
누군가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그건 보통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비를 벌기 위해 중고등학교 입시(준비)생을 상대로 과외'하는 걸 일렀던 거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런 거와 무관하게 재미로 '사이비 아르바이트(?)'를 조금 했긴 하지만, 녀석이 했던 아르바이트에 비하면 그야말로 저는 날도둑놈(물론 대가를 받거나 바라지도 않았으니까 그것도 좀 그렇지만)에 진배없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순간에 녀석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 잠깐 이야길 나눴는데 녀석 하는 이야기가 그 시절 새벽 시간대에 신문 배달을 했답니다.
학교를 나온 뒤 나중에 제가 가져본 직장이나 직업(?)이 그 시절엔 너무나도 많아 기억도 다 못함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헤아리지도 못하지요.
그런데도 그 시절 찍소리 나게 고생했던 직장이 '무등경기장' 근처에 있었답니다.
거기서 설비 일을 하면서 꽤 먼 곳에서 출퇴근했었는데 녀석은 그 길에서 신문 배달을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른 새벽에 나와 아직 신문이 도착하지 않았을 땐 거기 무등경기장 옆 아스팔트 큰길에 대자로 누워 하늘을 바라봤다는 이야기…
총총 무수한 별 받으며 온몸이 너무나도 시원했다는 이야기 등등에 충격을 받았는지 제 살아온 과정을 다시금 깊이 되새기게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녀석은 고학생(苦學生, 출처: 다음 사전에서 -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학교에 다니면서 고생하며 배우는 학생)이었던 겁니다.
그 친구 잘살고 있을까요?
고향이 영암이면서 까탈스러울 정도로 자존심이 세서 누구한테도 넙죽 고개 숙이지 않았던 옹골찬 친구야!
나 중근이다. 나는 몸이 부실해서 너 이름 잊었지만, 너는 똘똘하니까 기억하고 있겠지?
친구야~ 기억 못 해도 괜찮아!
찢어질 만큼 암울했던 그 시절을 일찌감치 박차고 일어나서 네가 이제는 가족의 중심·사람의 중심·세상의 중심이었길 생각했었다.
혹여 아직은 그 중심에서 약간 비켜 있지만, 언젠가는 꼭 그 중심으로 복귀하길 기원해본다.
내 친구야. 아프지 말고 늘 건강하게 지내라.
~ 기억의 저편 ~

'짙은 녹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문득 새 책보다가 머리 살랐던 그 옛날이 생각났습니다. (0) | 2019.05.26 |
|---|---|
| 플래시라는 놈, 때로는 녀석 탓에 속 터져 미칠 것만 같았건만 (0) | 2019.05.25 |
| 이놈 블로그에서 제목·주소가 또 날아가지나 않을까 불안해지네요. (0) | 2019.05.24 |
| 야~ 이건 정말 어떻게 해도 답이 없는 거야!!! (0) | 2019.05.23 |
| 와~ 이것이 뭐냐^^^ (0) | 2019.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