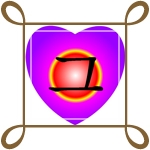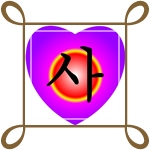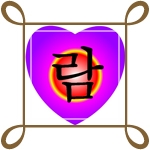내 사춘기 시절 마지막 동심이 꼼지락거리고 있었을 텐데…. 흑흑흑^^^
페이스북 메인화면의 윗부분에 쓸 배경 사진을 우리 고향 땅 언저리 어느 부분에서 따오려고 했습니다.
고향 땅을 지도로 찾았을 땐 네이버나 다음 지도(카카오맵)를 주로 봤었는데 요번엔 묘하게도 구글 어스에서 보기로 했답니다.
거기서 확대와 축소를 거듭하다 드디어 고향 땅 하늘에까지 들어왔는데요.
그곳에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우리 마을 저수지(풍양면 강동수원지)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옆 마을 저수지(도화면 가화저수지 - 일명 영추감저수지)를 번갈아서 쳐다보게 되네요.
강동수원지가 있었던 자리 상류에선 제 사촌 큰형님께서 45년에서 50년쯤 전에 그 자리에 오두막집을 짓고는 염소 수십 마리를 방목해서 키우며 사셨던 자리기도 하고 그로부터 수십 년 뒤엔 그곳 산길 논에서 제가 처음으로 손수레도 들어가기 힘든 그 산길을 경운기로 볏단을 실어 아랫마을까지 오갔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세상으로 떠났지만, 그 논의 주인집 작은 아들이기도 했고 제게는 한 살 터울이라서 무척 가까웠던 그 형은 그날 경운기에 너무 많은 짐을 실어 비탈에서 버티지 못하고 그냥 굴러 버렸지요.
그래도 다행히 수십 미터 낭떠러지가 아녔기에 밑으로 가서 경운기 짐칸과 대가리를 분리한 뒤 따로따로 끌어 올리고는 다시 짐을 정리해서 날랐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영추감저수지 계곡엔 지금 제 초등학교 친구가 들어가서 염소를 키우고 있죠.
그 녀석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이 일이 년에 한 번씩 있는데 저보다 훨씬 지극정성으로 나오는가 보더라고요.
그 저수지는 제 사춘기적 마지막 동심이 출렁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추억을 어젯밤부터 곰곰이 되짚었는데 그때가 중3이었을지 고등학생이었을지를 판가름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아무래도 그때가 고등학생이었을 때가 더 타당할 듯도 싶네요.
중3이었으면 제가 당시 울 동네서 맡았던 자리가 있었기에 우리 넷(여자 둘, 남자 둘)만이 유흥을 떠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방학 때나 고향 집에 들렀던 광주 유학생 신분이라서 그 시절 고향 땅에서 만난 우리 넷이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즉흥적으로 결심했을 가능성이 더해 보입니다.
우린 그때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한잔하려고 남자 쪽은 술 한 말을 떠메고 여자친구들은 그날 술 안주할 것을 가져가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하얗고 둥그런 플라스틱 한 말들이 막걸리 통을 우리 둘이 교대로 매고서 드디어 좁은 샛길(주홍색의 막걸리길)을 넘어 산길을 타고 저수지에 도착했답니다.
~ 그 귀한 마지막 동심에 꽃을 달아주세요 ~

여자애들은 도착하자마자 술안주 만들기에 바빴고요, 속없고 철없는 우리는 막걸리 쉬지 않게 저수지 물에 담그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홀라당 벗어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 저수지 물은 바닷물과 다릅니다. 바다에선 수영하다가 지치면 사지 쫙 뻗고서 하늘 향해 누워서 꼼짝도 안 하면 그대로 물에 떠서 있거든요. 혹시 그 순간의 조류나 파도 탓에 몸이 기울거나 가라앉으려고 하면 손이나 다리 살짝 팔랑거려서 띄워주면 그만인 데 반해 소금기가 없기에 부력이 거의 없는 내수면의 물(저수지나 수영장도 마찬가질 거예요)에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라앉더라고요. -
친구와 저는 그 느낌을 금세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곧 여자친구들과 한잔하면서 놀 생각을 하니 그까짓 거야 뭐^^^…. 그랬는데….
'야! 너희들 거기서 무슨 짓거리 하고 있어! 꼼짝 마라! 이 새끼들아!!!'
그 한가로운 곳에서 그 조용한 곳에서 어디선가 벼락처럼 거대한 고함이 울려 퍼졌죠!
일제히 소리 나는 쪽을 보니 저만치서 웬 청년이 우릴 노려보며 섰던 겁니다.
그러더니 성큼성큼 걸어서 우리 쪽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어요?
가까이 와서는 우리 넷을 자기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나와 친구는 그 순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였지만, 어찌 보면 천만다행으로 우리 여자친구들은 아직 덜 벗은 몸이라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 동네와 옆 동네!
물리적으로는 그 경계가 어딘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워도 행정구역으론 면(행정구역 단위로 도, 군, 면, 리 중 면에 해당)을 경계로 했던 지역이라서 서로 왕래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그쪽은 그쪽대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심지어 중학교까지 각기 면 단위 내에 자리하기에 교류할 일이 거의 없어 우린 그날 납치된 거나 마찬가지였었죠.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외가가 그 마을에 있어 어렸을 적엔 자주 들리기도 했었고요, 좀 더 커서는 그쪽 소식을 이따금 흘려듣기도 했었기에 거기서 우릴 불러 세운 당사자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면상일지는 대충 짐작은 했었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걸 무기 삼아서 외삼촌이 어떻고 외삼촌들(지금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당시엔 친 외삼촌 말고도 외삼촌이 두 분이나 더 있었음) 들먹이면서 저도 다 이 동네에 뒷배경이 있으니 여기서 멈춰달라고 눈치코치 다 했지만, 무식한 그분(?)한텐 씨알도 안 먹히데요.
지금은 그런 제도도 사라졌지만, 당시엔 도시 대학가의 하숙촌이나 조용한 절 또는 시골의 한적한 곳에 움막 짓고서 사법고시 공부하는 분들이 이따금 있었습니다.
그분도 그중에 한 분이란 걸 이전에 얼핏 들었거든요.
그분 그날 무릎 꿇린 우릴 대고 일장 '성교육'을 시켰습니다.
흔히 말하는 '미성년자 성추행 / 성범죄' 이런 따위가 아니라 '강간이 어떻고 강간미수가 어떻고' 그야말로 말도 안 된 소리를 연달아서 짖어댑니다.
그런 소리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오로지 무릎이 아파서 죽겠더라고요.
오로지 '깨복쟁이 친구'였던 우리 넷을 동심! / 사춘기가 아무리 드세다 해도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우리 넷의 애틋한 동심! / 여자친구들 앞에서 훌떡 깨 벗을 수 있었던 마지막 동심!
그 동심이 그날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답니다.
그날 가져간 막걸리 저수지에 콸콸 부어버리고 빈 통만 매고서 돌아왔습니다.
산 넘을 때의 활기 넘치고 팔딱팔딱 뛰었던 정열 소리소문없이 날아가 버리고 우리 그날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에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로는 그날 함께 했던 여자친구들 다시는 또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 뒤로 사십 년이 넘은 세월 동안 한두 번은 만났을 텐데 얼마나 무심하게 만났기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기억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날 얼마나 충격받고 힘들었으면 우리 얼굴 보는 게 부끄러움을 넘어 고통이 됐겠어요?
그 못된 놈이 훗날 법조계에 입문했다는 소린 아직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 못된 동심 학살자가 떠벌리는 잣대는 세상 어디에도 온당치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짙은 녹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가 지루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머릿속에선 벌써…. (0) | 2021.03.24 |
|---|---|
| 크롬에서도 자바스크립트 시계가 돌아가는데 왜 알람만 안 됐었지? (0) | 2021.03.21 |
| 야호! 페이스북에도 해방구가 있었다!!! (0) | 2021.03.20 |
| 크롬, 노래 연속 재생이 잘 안 되니까 노래마다 일일이 눌러서 듣기로 했다! (0) | 2021.03.19 |
| 또 그럴 건가? 업데이트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변경 내용 취소 중…. (0) | 2021.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