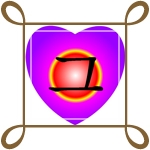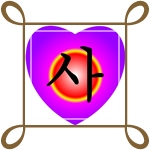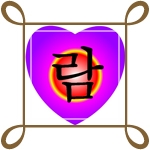화장지 ▷ 오른쪽 벽에 걸렸다 @
며칠 전 우리 집에서 생긴 실화입니다.
그날 낮인데 평소 여느 때처럼 편리한 복장에 제멋대로의 용모로 노닥거렸을 겁니다.
어디서 걸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들어보니 전혀 모르는 낯선 번호인데 계속해서 울립니다.
누군가가 내게 실수로 내 번호를 눌렀다면 반복해서 두세 번 울렸을 즈음에 멈추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랬기에 잠시 내버려 뒀는데도 벨 소리가 멈추지를 않네요.
도대체 뭘까 싶어서 받아봅니다.
참고로 나는 '여보세요!'를 쓰지 않고 '네. 말씀하세요!'를 수화용어로 써요.
- 네. 말씀하세요! -
[응. 나여 나! 어쩌고저쩌고 신동아 아파트 어쩌고저쩌고….]
- 아! 엄마^ 엄마네! 엄마 웬일이에요? -
[응. 내가 어쩌고저쩌고하여 호박을 들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가 어쩌고저쩌고….]
- 거기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내려갈 테니까요! -
[뭐라 / 뭐라 / 뭐라….]
그렇게 전화를 끊고서 나는 그 허술한 차림에 개떡 같은 용모였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제방에서 쓰는 실내화를 벗지도 않은 채 아파트 현관문 열고 나가서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탄 뒤 1층으로 내려갔지요.
제가 아주 오랜 세월 [엄마]라고 부르는 분은 꼭 세 분뿐입니다.
그 처음이 전라도 고흥반도 바닷가 마을에서 아주 오래 전 한 동네 주민으로 함께 살았던 어느 살가운 아주머니(초등학교 여자친구 어머니지만, 그 친구와는 별로 가깝지도 않았음)가 첫 번째 엄마이고요,
그다음이 촌에서 광주광역시에 처음 올라왔을 때 아들처럼 반갑게 맞아 준 고등학교 입학한 뒤 첫 단짝이었던 그 친구 어머니가 두 번째 엄마며,
그 마지막 엄마가 광주지역 노동운동의 핵심 선구자기도 하고 인성 면에서도 세계적 톱 그룹에 들 [박종현 동지의 어머니]자 며칠 전 그날 제게 난생처음으로 전화해 주신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 집에 함께 사는 어머니는 그냥 [전라도 표준말]로 호칭하지요.
- 어무이! 뜬금없이 왜 그라요? -
- 엄니! 이번 여름에 고흥 한 번 내려갔다 올까라? -
- 어메! 아까 그건 어메가 한 거이 아니다고라? -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우리 어머니 목소리며 호출에 개벽 천지라도 일어난 것처럼 엄청나게 깜짝 놀랐답니다.
대번에 나는 형님(박종현)한테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요.
누구나가 갑자기 큰일을 당하면 정신이 없어서 핸드폰이나 아무 데라도 적힌 이름이나 연락처에서 만만한 상대한테 연락해대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목소리 알아채자마자 나는 그런 불길한 생각부터 했었는데 그 잡념이 더는 나아갈 수도 없을 만큼 빠른 어투로 어머니 목적이며 위치를 읊어댔어요.
그랬기에 그 불길한 망상 제 머리에서 채 1초도 머무르지 못하고 흩어졌지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어머니가 어딨는지 안 보이니까 마구 불러봅니다.
- 엄마! 엄마! 어딨어요??? -
그렇게 두세 번을 소리쳤는데 바로 옆 동과 사이를 둔 샛길 쪽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 여깄어! 여깄다니까---!!!]
[나는 여긴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니더구먼!!!]
- 아이고 엄마도 참---!!! -
여행용 가방인 캐리어를 닮은 손수레에 뭔가를 묵직하게 담아서 끌고 옵니다.
얼른 다가가 건네받고 보니까 그 모두가 커다란 호박이더라고요.
그 모두가 세 덩이인데 둘은 반으로 갈라서 씨까지 다 발라낸 상태고요 나머지 한 통은 밭에서 딴 모양새 그대로였습니다.
-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많이---? -
[쪼그만 밭이 있어 오래간만에 가 봤는데 내가 심은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이 여러 대 나서 컸더구먼!]
[그래서 그놈들 어떡할 건지 종현이랑 말하던 중에 자네 생각났다며 걔가 연락처를 줬던 거야!]
- 아하! 그래서 그랬구먼요!!! -
엘리베이터로 올라오면서 이것저것 나눴던 이야기가 그런 부류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양쪽 어머니들 얼싸안고 인사합니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나는 노상 이렇게 아픈데 자네는 하나도 안 늙었네!!!]
[하하^^ 호호!!]
두 분은 호랑이띠로 동갑에 얼렁뚱땅 친구입니다.
얼굴 본 지가 오래되어 못 알아보면 어찌할지 걱정된다며 제가 모시러 가기 전에 어머님 말씀하셨는데 현관문 열자마자 서로가 곧바로 알아채셨으니까 이건---!!!
우리 아파트와 두 블록 사이에 박종현 동지 사는 곳이 자리합니다.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팔십 대의 중후반에 들어선 어르신께는 그 결심 매우 거대해야 가능하지요.
더군다나 그 위치도 정확히 모르면서 큰 짐이었을 그 많은 걸 끌고 오려니 그 고역 오죽했겠냐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뜻밖으로 오셨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 고마운 어머니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흔한 사이다·콜라·우유 같은 것도 없었지요,
냉장고를 뒤져서 뭐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안 보입니다.
하다못해 끊인 물도 안 보입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약물이라며 물 끓일 때 뭔가를 넣어서 물빛이 누리끼리한 그 뭔가를 병에 담아서 드시는데 그 희한한 걸 드릴 수는 없겠고 제가 물먹는 방식 그대로 그 큰 노고 아끼지 않으셨던 엄마 / 엄마 내 엄마한테 그냥 수도꼭지 올려서 그 물을 받아 전하고 말았답니다(아!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눈치도 없이---!!!).
그렇게 오신 우리 어머니 / 아주 잠깐 그것만 건네시고는 곧바로 가셨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했다는 말고 제대로 못 했는데….
그로부터 하루쯤 지나서 제방에서 신발(실내화)을 찾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입니다.
- 어구^ 그놈이 어디로 갔나 / 어구^ 그 잡것이 어디로 갔나??? -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니 전화 받던 그 날 버선발(실내와 신은 채 아래층 아파트 도로까지 달려갔던 거)로 달려 나갔던 게 떠오릅니다.
부랴부랴 현관으로 갔더니 바닥에 두 켤레가 보이고 나머지 하나는 비상용(비 오는 날 발이 젖었을 때 쓰는 실내와)으로 바닥과 밀 창 사이 턱에 놓였습니다.
그랬기에 바닥에 놓인 둘 중 하나를 들고서 제방 화장실로 가져와 씻었는데 아 글쎄 그놈 옆구리 꿰맨 자국에 검정 실로 바느질이 된 게 보입니다.
- 뭐야! 이건 아니잖아!!! -
저는 실내화가 떨어져 덜렁거리면 아예 나사못을 쳐서 드라이버로 꽉 조여 버리거든요.
또 밖에서 신고 다니는 신발도 아니고 실내화기에 그렇게 떨어졌을 리도 없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 나갈 때 쓰는 밖에서 신고 다니는 신발 대용이나 화장실 신발은 더러 떨어지기도 해서 그런 식으로 꿰매니까.
씻었던 놈을 들고 현관으로 가서 바꿔왔지요. 그러고는 다시 빡빡 씻어서 화장실 신발 말렸던 자리에 걸어둡니다.
참고로 우리 어머니는 제가 신은 실내화 스타일에 불만이 커요.
- 야! 바깥에서 아무 데나 끌고 다니는 걸 어디 방으로 가져가냐!!! -
여러 사람과 나를 비롯한 대부분은 그걸 차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 순간마다 아마도 이런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외양이나 형식을 중시했던 우리 어머니---]
[눈에 보이든 말든 형식보다는 내용에 치중했던 나---]
그 차이는 매우 작지만, 일상에서 너무나도 잦은 트러블을 가져와요.
그 차이를 극복함이 [민주주의]라고 자처하면서도 그 길은 매우 험준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배우고 익혔던 성서 구절이지만, 내가 배운 성서에 그와 관련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 [정/반/합] 수수께끼 같은 이 문제의 문명적 해법은 [민주집중제]에 있다!!! -
공식은 그렇게 배웠지만, 현실에서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다투는 지점마다 하나의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다음으로 이어질 텐데 아주 작은 거에서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이 복잡하고 오묘한 문제 아마도 머잖아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이 문제 해법을 들고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 야^ AI 너! 어지간히 처먹고 내 실내화 좀 이리 갖다주라!!! -
~ 사랑 ~

'짙은 녹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페이스북 친구 - 다시는 무분별하게 받지 말아야지^ (0) | 2023.02.24 |
|---|---|
| 한방에 큐가 있는 곳 - 무료로 드라마 영화 보는 곳 (0) | 2023.02.22 |
| 오늘부로 드라마 [아들과 딸] 64편을 다 보았다! (0) | 2023.02.22 |
| 68에 잔나비라? 어디 한번 꼽아볼까나??? (0) | 2023.02.20 |
| 보물단지에서 천덕꾸러기 된 나의 매를 버는 속물들 (0) | 2023.02.18 |